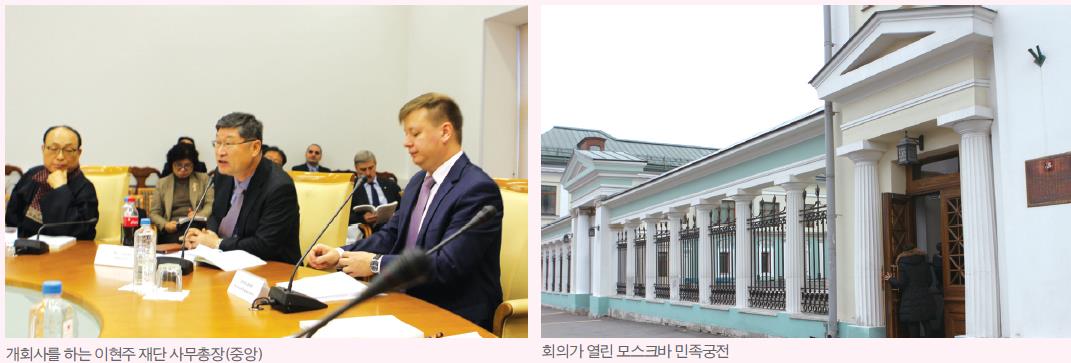동북아역사재단 2018년 01월호 뉴스레터
- 기연수 (재단 자문위원장, 한국외대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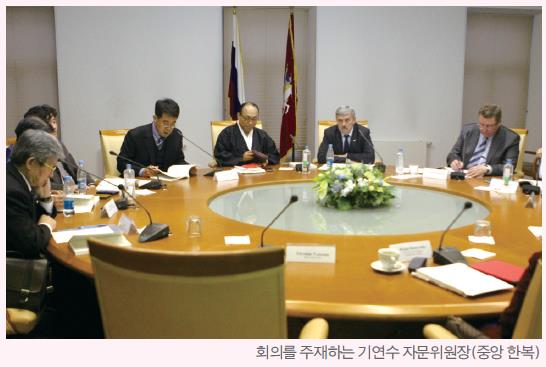
“러시아를 아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안다고 대답하겠지만, 잘 아느냐고 물으면 잘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국내 한 저명 원로교수의 최근 칼럼 첫머리에 쓴 글에 빗대어 표현한 러시아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다. 러시아를 가보지 않은 사람은 러시아에 대해 몇 권의 책을 쓰지만 한 달쯤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은 한 권의 책을 쓰고, 3개월쯤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은 겨우 한 편의 여행기를 쓴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1년 이상 지내본 사람에게 물으면 “나는 러시아를 잘 모르겠다. 한 권의 책은커녕 한 편의 여행기도 쓸 수가 없다”고 대답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필자는 제1회 한·러 국제학술회의에 다녀와서 러시아에 대해 이 점 하나만은 더 잘 알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러시아 학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학문적 사명에 대해 정말 진지하고 열성적이며 성실하다는 사실이다. 중진 원로학자들일수록 더욱 그렇고 그들 자신들의 이런 학문적 태도에 대한 자부심 또한 겸손을 넘어서고 있다.
보다 포괄적인 학술교류를 추진해야 할 한-러
필자는 대학에서 40년 넘게 러시아 관련 연구와 교수를 하였고(역사·정치사상사), 그동안 모스크바대학(MGU)과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MGIMO) 초빙교수를 지내며 30여 차례나 러시아를 방문했다. 작년 10월 중순 러시아 방문은 재단 자문위원장으로서 한·러 국제 학술회의 사전 준비단계에서 적절한 카운터파트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 재단 이현주 사무총장, 최덕규·김영수 연구위원과 함께 러시아과학원 산하 동방학연구소·극동연구소, 모스크바대, 모스크바국제관계대, 러시아외교아카데미, 주러 한국대사관 등을 방문하여 해당 최고 책임자 전문가·교수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그 결과 우리 사전답사단은 잠정적으로 동방학연구소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동방학연구소가 한·러 관계는 물론 동양에 관한 러시아연방 내 모든 학문적 연구 활동을 조율할 수 있는 입장에 있고 연구 자료 역시 가장 풍부하게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사실 재단은 설립 당시부터 러시아과학원극동분소 역사고고민속학연구소와 더불어 학술교류를 통해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발굴사업을 진행하여 최근까지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그 결과물을 매년 책으로 출판해왔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 연해주는 한국 근현대사와도 매우 밀접한 지역이며, 특히 10세기 전후 발해사의 무대로 현재까지 이곳에서 다양한 문화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재단은 시공간적(時空間的)으로 한-러 양국이 공유한 역사를 재조명하는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학제적 학술교류를 추진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단은 모든 관계 학술활동을 컨트롤하고 조정할 수 있는 모스크바 소재 중앙 연구기관을 찾아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러시아 동방학연구소 공동주최로 지난 11월 8일 모스크바 민족궁전에서 개최한 “2017년 한·러 국제 학술회의 : 한·러 관계사 연구의 새로운 성과와 전망”으로 나타난 것이다.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학술교류의 장
이번 국제 학술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시 학술회의 자료집을 꼼꼼히 살펴보아야겠지만,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중급 주제에 따라 발표된 소주제의 제목들만 살펴보아도 이 회의의 성격과 그 중요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제1부 <한국과 러시아에서의 고대사 연구>에서는 ‘러시아에서의 발해 고고학(러)’ ‘발해 염주성 발굴의 전개와 방향(한)’ ‘자바이칼 북부지역의 고대 토기(러)’ ‘한국의 고구려사 연구 쟁점과 성과(한)’ 제2부 <근대 한·러 관계사 연구현황과 새로운 성과>에서는 ‘러시아의 한국학 연구 현황(러)’ ‘근대 러시아의 해양 탐사와 울릉도·독도 발견(한)’ ‘아관파천과 주한 러시아공사 베베르(러)’ 제3부 <한·러 관계사의 새로운 연구주제와 전망>에서는 ‘글로벌 전신 네트워크와 한·러 전신선, 1884~1904(한)’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 1910~1945(러)’ ‘러일전쟁과 대한제국의 위기관리 외교(한)’ 등 양국이 각각 다섯 편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모두가 주옥같은 논문들이지만, 학술논문이 아닌 동방학연구소 보론쵸프(Воронцов А.В.) 박사의 ‘러시아의 한국학 연구 현황’이라는 보고서 형식의 일목요연한 발표는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끈다. 또한 재단 김현숙 연구위원이 발표한 ‘한국의 고구려사 연구 쟁점과 성과’에서 앞으로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 학자들까지도 동참해야만 제대로 된 학술회의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한 가지 덧붙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러시아 측 발표 논문들이 모스크바 소재 동방학연구소와 극동연구소,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연구소, 이르쿠츠크대 등 매우 다양한 곳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이밖에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 우리 측 학자들은 물론 러시아 측 중진·원로학자들의 모습이 앞서 이야기한대로 매우 진지하고 자신감과 함께 자부심에 차 있었다는 사실이다.
종심(從心)의 나이를 훨씬 넘어선 필자는 이제 5년 동안이나 자문위원으로 인연을 맺어온 재단을 멀찌감치 마음으로나 격려를 보내며 좀 쉬고 싶다. 물론 재단의 주된 업무가 중국과 일본에 관한 것들이지만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러시아와의 학술교류도 보다 강화되고 제2회 한·러 학술회의가 내년에 서울에서 개최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더욱 알차게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러한 러·중·일 관련 연구 결과들이 김도형 재단 이사장의 말처럼 “역사적 ‘화해’라는 징검다리를 놓으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