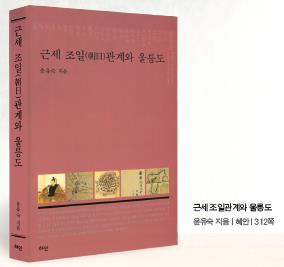동북아역사재단 2016년 11월호 뉴스레터
- 정성일(광주여대 교수)
독도[다케시마, 竹嶋]하면 가장 먼저 시마네현이 떠오른다. 아마도 대마도[쓰시마]를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16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대마도가 그 중심에 있었다. 울릉도 영유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이 외교 교섭을 벌여 나갈 때, 대마도는 조선의 울릉도 영유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것은 대마도 사람들이 울릉도에 대하여 영토 야심을 가졌기 때문일까? 아니면 막부에 잘 보이기 위하여 공적을 쌓으려 한 의도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일까?
2016년 4월, 조선시대 울릉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책이 간행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윤유숙 연구위원(이하 ‘저자’)은 조선시대 울릉도쟁계[일본은 竹島一件이라 부름] 문제를 새롭게 조명했다. 국내 연구자로는 드물게 저자는 대마도 문서 분석과 함께, 돗토리와 오키 지역 현지 조사를 병행하여 일본 자료를 꼼꼼하게 재검토하였다.
일본 외무성의 주장을 무너뜨린 일본 자료
일본 외무성은 이미 17세기 중반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이 확보하였다는 주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 그 바탕에는 가와카미 겐조(1966년)의 논리가 깔려 있다. 저자는 그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그 가운데 “C. 1696년 이후에도 일본이 송도[독도]를 오키 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보자. 이는 『죽도지서부(竹嶋之書付)』가 “인슈[오키] 안에 포함되는 대상으로 송도[독도]를 비롯하여, 지부리[千振], 나카노시마[中嶋], 다쿠히야마[燒火山]를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가와카미의 자료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
저자는 가와카미가 인용한 이 자료를 다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슈[오키]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지부리[千振], 나카노시마[中嶋], 다쿠히야마[燒火山]의 셋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송도[독도]는 그 셋과 구별되어 아래 위치에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부기(附記)로 적어 놓은 것도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에 관한 설명”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 책의 97쪽에 저자가 제시한 『죽도지서부(竹嶋之書付)』를 보더라도, 원 자료의 기록자는 ‘은주지내(隱州之內)’로 시작하면서 가는 선으로 지부리, 나카노시마, 다쿠히야마의 셋을 묶어 놓았다. 그러면서 그 끝머리에 “이것은 모두 섬이다[此分不殘嶋也]”라고 적어 놓고 있지 않은가! 그 아래 부분에 “송도[독도]라고 하는 것은[松嶋と言]”으로 시작하여 가는 선으로 연결 표시를 하면서, “죽도[울릉도]와 40리 거리에 있고, 섬이 두 개 있으며, 이 두 섬의 간격은 40칸이다”라고 적고 있다. 그러니 저자의 주장대로 ‘인슈[오키] 안에 들어가는 것’과 ‘송도[독도]를 설명하는 것’이 별개로 존재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만일 저자의 주장이 옳다면, 이 자료는 가와카미의 논리와 정반대로 오히려 ‘송도[죽도]가 인슈[오키] 안에 들어가지 않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죽도지서부(竹嶋之書付)』의 기사만 가지고 “1696년 이후에도 일본이 송도[독도]를 오키 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일본 외무성 논리가 과연 성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막부의 다케시마[울릉도] 조선 영유 재확인
저자는 1620년대 초 오야[大谷]와 무라카와[村川] 가문이 막부로부터 ‘죽도 도해(竹嶋渡海)’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이것은 쓰시마 번, 돗토리 번과 오야·무라카와 가문의 고문서 등에 막부 로주의 봉서 발급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그 시기를 이케우치 사토시는 1625년으로 추정한 바 있다.
“1691년부터 울릉도에 조선인이 수십 명 규모로 도항하기 시작하였다. 조선과 일본 쌍방의 도항이 잦아지자 울릉도 도항권을 둘러싸고 양국 어민이 충돌했다. 그것이 1693년 안용복과 박어둔 일행 납치 사건으로 이어졌다. 오야 가문과 돗토리 번은 울릉도 어업권을 조선인에게 내주려 하지 않았다. 그러한 입장이 막부를 거쳐 쓰시마 번에 전해졌으며, 쓰시마 번은 조선정부와 외교교섭에 나섰다. 그런데 1696년 막부는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 금지’를 결정하였다. 1837년에는 그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저자는 마지막 제6장에서 1836년 울릉도 도항이 적발되어 막부의 처벌을 받은 ‘하치에몬’ 사건을 적은 일본 자료를 한국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여 제공하였다. 이 자료가 조선시대 울릉도 문제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풀어야 할 과제
조선시대 울릉도 문제는 이제 완전히 해결되었을까?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 이유는 임란[1590년대]과 호란[1620~30년대] 무렵 조선인의 울릉도 도항 기록이 여전히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17세기 독도[다케시마] 영유권 확립’ 주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데서 연유한다.
이러한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승려나 사찰의 해상활동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696년 안용복과 함께 도일한 뇌헌(雷憲)이 그 한 사례가 될 것이다. 그가 안용복의 5촌 숙부(雷憲 以其五寸叔)인 점이 흥미로운데(『승정원일기』 숙종 22년(1696) 9월 27일 경진), 다만 기존 연구에서 뇌헌을 ‘흥왕사(興旺寺)’ 주지로 본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전라남도 여수의 ‘흥국사(興國寺)’가 옳다. 국(国)이라는 글자를 구(口)를 왼쪽 변에 쓰고 오른쪽 변에 옥(玉)을 써서 적기도 했다. 조선 후기 사찰의 경제활동을 추적해 가면서 이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