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2007년 09월호 뉴스레터
- 제2연구실 부연구위원 이성제
중국의 동북공정이 촉발한 한·중 간의 역사갈등을 둘러싸고 관련 학자들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었지만, 그것의 실행을 가로막는 난관은 적지 않았다. 입장을 달리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만나 대화의 장을 열어보자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만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난 7월 20∼21일 이틀 간 일본 후쿠오카시 소재 큐슈대학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미국한국연구평의회(ICKS)와 큐슈대학 한국연구센터가 주최하여 '동북변강의 역사연구' 즉 동북공정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동북공정을 주제로 삼은 기왕의 학술대회가 여럿 있었지만, 이번 학술회의는 참석학자들의 면면에서부터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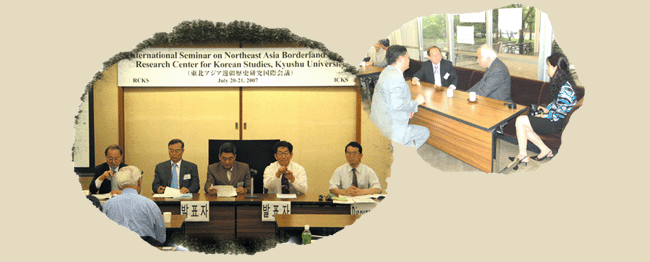
우선 미국과 일본 학자들의 참여는 동북공정이 어느덧 한·중 양국만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미국측 참가자인 김일평 ICKS회장 및 강희웅 하와이대학교 명예교수 그리고 케네스 퀴노네스 아키타 국제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와 토론의 자리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내세우는 논의에 비해 주장을 뒷받침해 줄 근거가 너무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일본측에서는 일본 내 한국 고대사 전공학자 두 사람이 참가하였다. 하마다 고사쿠 큐슈대학교 교수는 고구려와 현도군의 관계 기록에 대해, 현도군은 아주 짧은 시기에 존속했을 뿐, 그것을 근거로 고구려에 대한 중국측의 지배를 말할 수는 없다고 논평하였다. 그리고 관련 기록에서 정작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한 군현이 고구려에 의해 쫓겨 나갔다는 사실이라는 점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또 한명의 일본학자 이노우에 나오키 교토현립대학교 교수는 한국측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전공자로서 날카로운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한국측 논의에는 종종 일반적 수준의 논리나 일부 학술적 오류가 있는 주장도 보인다고 하면서 보다 정치하고 차분한 반박 내용을 주문하였던 것이다.한국측에서는 정종욱 서울대학교 초빙교수를 비롯하여 안병우 한신대학교 교수와 김지훈 성균관대학교 연구원 그리고 김용덕 재단 이사장과 김정희·김민규·이성제 연구원이 참석하였다. 하지만 당초 예정과 달리 조희승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장이 참석하지 못하여 아쉽게도 북한측의 입장은 들어볼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이틀 간의 학술회의가 거둔 성과는 무엇보다 우리와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중국측 학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려성( 聲)은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변강사지연구중심의 주임으로, 한·중간 쟁점이 되어온 동북공정 사업을 책임 지고 있는 연구자이다. 또한 손진기(孫進己)는 동북공정이 추진되기 이전부터 중국 동북사 연구를 선도해온 원로학자이다. 어떻게 보더라도 이 두 사람이 동북공정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아 이들의 참석과 입장 표명은 향후 한·중 간의 역사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요한 디딤돌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먼저 손진기는 좥中韓朝歷史分岐的演變좦의 제목 아래 동북공정의 추진 과정과 마대정의 역할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동북공정의 사업계획과 연구 방향에 대해 손진기 등의 반대가 있었지만, 마대정은 당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여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 『광명일보』에 '고구려귀속'의 글을 게재했던 변중(邊衆)이 바로 마대정이라는 사실도 밝혀주었다. 그러면서 동북공정은 중국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추진된 것이 아니라, 마대정 개인이 당국의 비호를 받고 있는 듯이 행동했기에 나온 오해였음을 강조하였다.
동북공정에 대한 中 학자들의 흥미로운 주장들
또한 려성의 발표 내용 역시 흥미로운 것이었다. 그는 좥東北邊疆歷史與現狀硏究좦의 주제로 동북공정 사업의 입안 내용에 대해 설명한 뒤, 고구려 역사문제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밝혔다. 그런 뒤 중국 역사강역의 최종 확정이 궁극적으로 변강사지연구중심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설명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라, 일부 논란이 있었던 동북공정의 과제 수효는 최종적으로 110개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역사와 현실의 분리, 학술과 정치를 분리한다는 양국 간 합의사항을 거듭 강조하였고, 나아가 양국 간 학술교류를 강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개진하였다. 그렇지만 고구려사 이해와 관련하여서는 종래의 주장 그대로였다. 고구려가 현도군 경내에서 수립된 정권이라는 점, 중원왕조에 대해 시종일관 예속되어 있었고, 고구려와 고려왕조 사이에는 어떠한 계승관계도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던 것이다. 또한 고구려사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에 대해, 한국이 주장하는 역사계승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나, 한국 측도 고구려가 한대 현도군 경내에서 건국하였으며, 역사상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나아가 중국 역사 강역의 형성과 발전을 설명하는 이론의 개발에 쏟고 있는 관심의 일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의 발표 내용이 그 동안의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었거나 혹은 관련 의문을 속 시원히 해명해주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진기의 주장은 동북공정의 추진내용과 그 평가를 둘러싸고, 바깥에서 짐작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중국 내부에서 갈등이 적지 않았음을 드러내주었다. 또한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마대정의 입장이 상당 정도로 반영되었음을 확인시켜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려성이 밝힌 바와 같이 중국측이 양국 간 학술교류에 대해 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 학술회의의 여러 참석자들에게 의구심을 들게 하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손진기는 동북공정의 추진 경과와 그 문제를 중국 내의 독특한 사정과 마대정 등 일부 연구자 탓으로 돌렸지만, 중국 당국의 의지가 과연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였다. 또한 고구려사 이해와 관련하여 한국도 중국의 이해에 대해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또 다른 논쟁을 유발할 지도 모르는 제안일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회의석상에서 김용덕 재단 이사장과 정종욱 교수가 언명한 바와 같이, 이번 학술대회가 한중 양국간 학술교류의 전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 이번 학술회의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학술대회의 분위기로 보아 후속의 학술회의에서는 보다 진전된 논의와 성숙한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