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2022년 02월호 뉴스레터

2020년 Korea Journal의 한류 특집
근현대에 치우친 서양 학계의 한국학
최근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대중문화의 유행(韓流)으로 서양의 대학들이 한국 관련 강좌를 차례로 개설하였고 한국학이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학은 여전히 언어학, 문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국제관계학에 치우쳐 있고, 특히 한국사 분야는 식민통치, 한국전쟁, 경제발전과 민주화 운동, 한미관계 등 20세기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나아가 서양에서 활동하는 전근대 한국사 전공자 대다수는 18세기 이후 조선 후기에 치중되어 있다. 2023년 3월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미국 아시아학회(Association for Asian Studies)의 연례 학술회의에서 60개가 넘는 한국 관련 패널이 보이지만, 19세기 이전 시기 패널은 3개, 고려시대 발표는 문학을 다룬 단 1편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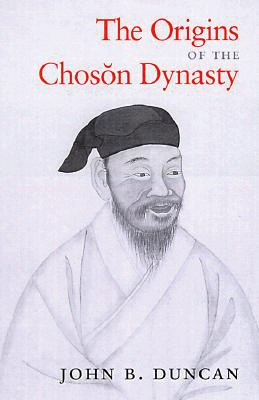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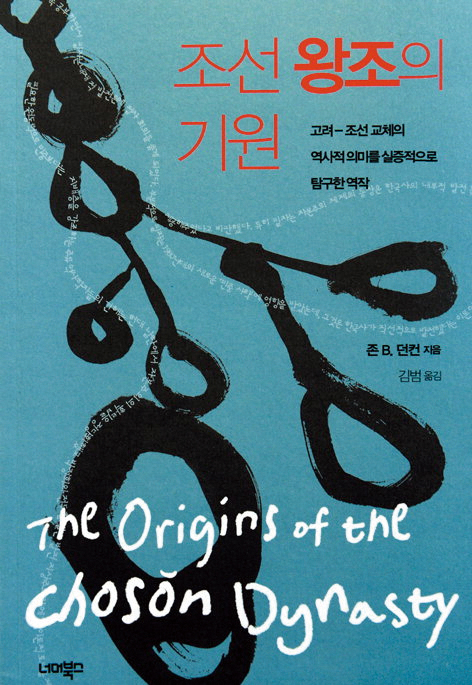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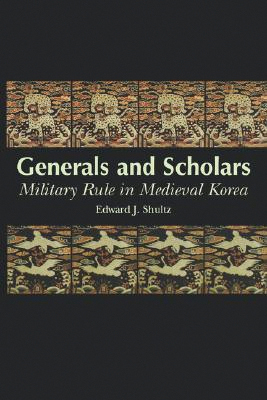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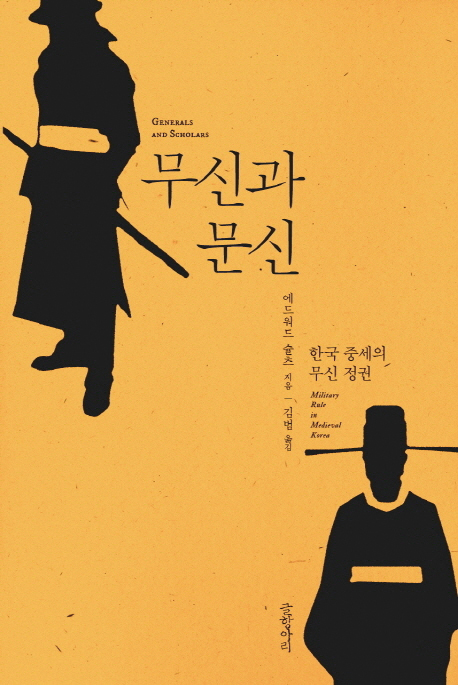
(상)던컨 교수의 저서와 한국어 번역본
(하)슐츠 교수의 저서와 한국어 번역본
서양 학계의 고려시대사 연구
서양 학계에서 고려시대 연구자는 항상 소수였는데, 이는 근현대에 초점을 맞추는 미국 학계의 지역학 교육과정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유럽 학계는 비교적 전근대 시기에 관심을 보였으나 전공자들은 여전히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특정 시기, 제도, 종교(불교) 등 일부 분야에 치중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서양의 고려시대 전공자들은 국내 학계의 주류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미국 UCLA대학의 던컨(John B. Duncan) 교수는 한국사의 시대적 변화를 새로운 세력의 등장과 연결하여 인식한 기존 해석과 달리, 조선왕조의 건국을 신흥사대부의 출현이 아닌 고려 건국 이래 계속 진행되어 온 중앙 집권적 관료체제의 완성 과정으로 보았다. 하와이대학의 슐츠(Edward J. Shultz) 교수는 한국사의 이례적 시기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무신정권 연구에서 한국의 문치주의적 전통이 바로 이 시기에 확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미시간 대학의 안준영(Juhn Y. Ahn) 교수는 최근 출간된 저서에서 여말·선초 숭유배불(崇儒排佛) 정책에 대해, 불교계의 부패와 성리학의 영향에 주목한 기존 해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였다. 던컨과 슐츠 교수의 저서는 최근 한국어로 번역되어 국내 학계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서양 학계에서 고려시대사 연구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전근대사 연구를 위해서는 한국어는 물론 중국어나 일본어, 그리고 한문의 독해력을 갖추어야 하기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서양의 대학원생들은 학위 취득 후 취업 등의 문제로 전근대 역사를 기피하고, 이에 은퇴하는 학자들의 자리를 채울 신진 학자들이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진행 중인 케임브리지 한국사(Cambridge History of Korea) 제2권 고려시대 집필자 중 서양 학계에서 활동하는 학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서양 학계 동아시아 연구자들이 고려를 보는 시각
한국학 연구자들 외에 고려시대에 관심을 가지는 서양의 학자 대다수는 동시대인 송, 거란, 여진, 몽골제국, 그리고 일본의 헤이안(平安) 시대와 가마쿠라(鎌倉) 시대 전공자들이다. 그런데 서양의 중국사 연구자들은 종종 ‘중국’(한족)을 동아시아 역사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한국 등 ‘주변’의 역사적 관점과 역할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특히, 풍부하고 다양한 사료가 존재하는 송대사 연구자들은 『고려사』, 『고려사절요』, 그리고 몇 문집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고려사 연구를 저평가하는 경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한 예로 서양의 중국사 대표 학자들이 참여하여 집필한 연구서이자 개설서인 『케임브리지 중국사』(Cambridge History of China) 제6권의 고려 관련 내용은 거의 전적으로 1960년대 출간된 헨톤(William Henthorn)과 로저스(Michael C. Rogers)의 저서와 논문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학계의 성과는 전혀 찾을 수 없다. 나아가 편찬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소략한 내용의 『요사』와 『원사』의 기사를 교차 확인하고 보충할 수 있는 한국사의 1차 사료 『고려사』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서양 학계의 동아시아 연구자들은 고려를 거란과 금, 그리고 송에 ‘조공’하고, 이후 몽골제국의 정치적 간섭의 대상으로 전락한 수동적 모습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소위 ‘한중관계사’ 연구에서 고려가 ‘조공’하였다는 중원의 사서 기록에만 집착한다면 몽골 이전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질서와 맹약체제(盟約體制)의 유동적이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기대할 수 없다. 고려가 한족 중심적 세계질서에 ‘순응’한 ‘제후국’(a loyal vassal) 혹은 ‘조공국’(tributary state)이었다는 선입관은, 정치와 경제적 동기, 문화 교류, 안보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 및 고려의 현실주의와 실용주의적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룬 한국 학계의 연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고려시대사 연구의 필요성
다양한 시대와 분야에서 많은 연구자를 보유한 서양의 중국학과 일본학도 초기에는 근현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다 점차 전근대를 심도 있게 연구하며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시대 역사와 문화의 다양한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서양의 동아시아 연구자들은 중국과 일본 학계의 성과와 시각을 통해 한국사, 특히 고려시대 역사를 접했다. 즉, 한국의 전근대 역사는 서양과 중국 및 일본의 ‘동양’으로 인식하는 편파적 시각에 의해 타자화·주변화되었다. 서양 학계에서 고려시대사 연구의 공백은 고려가 외부 선진 문화를 모방하였다는 기존의 편견을 간접적으로 ‘확인’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의 극복이야말로 한국학의 세계화 노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국내 학계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아가 독자적 시각에서 연구를 수행할 고려시대사 전공자 육성에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요구된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창작한 '서양 학계의 고려시대사 연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