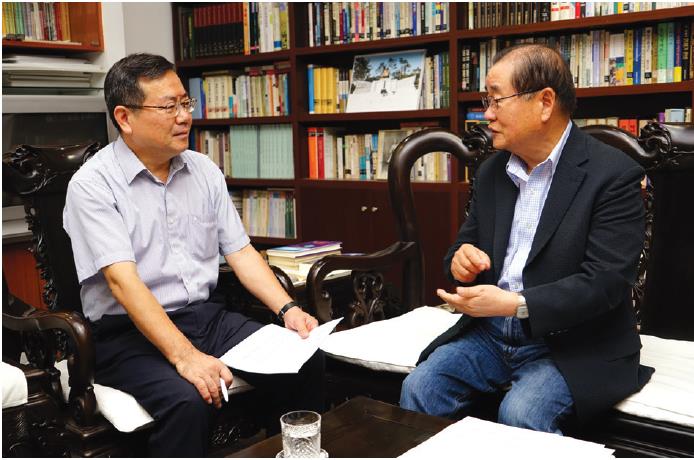동북아역사재단 2017년 08월호 뉴스레터
지난 8월 3일, 서울역사박물관은 광복 72주년을 기념해 우당 이회영 6형제의 독립운동을 조명하는 ‘민국의 길, 자유의 길’ 기획전을 열었다. 2017년은 우당 선생의 탄생 1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20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우당 선생의 후손 이종찬 우당장학회 이사장을 만나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와 애국의 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대담 : 장세윤 한일관계연구소장
이종찬(우당장학회 이사장)
1936년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1972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중국의 행정제도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서울 종로 . 중구)에 당선된 뒤 4선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1998년 국가안전기획부 부장, 2000년 새천년민주당 고문, 2010년 IBC(International Business Center)포럼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회장, 우당장학회 이사장 및 우당기념관 관장,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한국선진화포럼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 《숲은 고요하지 않다》1. 2, 《민족의 종을 울리며 민주의 탑을 쌓으며》, 《개혁과 온건주의》 등이 있다.
Q1 먼저 근황을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이사장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이거나 참여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이종찬 요즘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우당 이회영 6형제의 독립운동 ‘민국의 길, 자유의 길’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이 전시회는 제 조부님과 형제분들의 이야기이자 2019년을 맞이하는 다른 하나의 활동과도 연결이 되지요. 우리나라는 1919년 3・1 독립선언이 있었고, 이어 4월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국민의 의지에 의해 국권이 ‘제국’에서 ‘민국’으로 완전히 넘어간 시기죠. 즉 임금의 나라에서 백성의 나라로 바뀌었다는 큰 의미를 지닌 해가 2019년으로 10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1905년부터 시작된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을 선진국의 식민지 침략으로 보지 않고 문화적으로 동등한 나라(일본)가 이웃나라(한국)를 공격・점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치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과거 왕이 독점하던 주권이 외세 일본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넘어온 것으로 해석했고,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비록 망명지에서 수립했으나 처음으로 민주공화제를 헌법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런 거대한 역사적 흐름이 1919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는 2019년에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을 완공하고 국민들에게 그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Q2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이신데 어릴 적부터 독립운동이나 조국, 애국, 민족과 관련해 느끼셨던 남다른 감정이나 특별한 교육, 가풍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종찬 제가 성장하던 시기는 망명지 상하이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처지는 요즘으로 치면 난민과 같았는데, 조국이 없는 설움은 당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 친구로부터 걸핏하면 ‘왕꼬누(亡國奴)’라는 멸시를 받았고, 우리 부모님들은 “나라의 큰 일꾼이 되라”는 격려조차 마음대로 못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를 지칭하는 것인지 말할 수 없는 시기였으니까요.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빼앗긴 나라를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부모님들은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일본 영사관의 감시하에 있었으니까요. 우리나라에 대한 자각이 분명하게 제 가슴에 자리 잡은 것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한 후였습니다. 그때 지하로 피신해 계시다가 간간이 집에 오셨던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6형제와 독립운동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승만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영어를 잘해서 미국에 망명하여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분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 대학총장이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을 뽑았고 그분이 미국에서 외교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당시 제 가슴에는 일제에 대한 투쟁, 자주 독립 조국에 대한 그림이 가득 차 있었지만, 막상 귀국하여 보니 제가 존경하던 임시정부의 큰 어른들은 해방 정국에서 뒤로 밀리고 미군이 정치를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힘의 정치가 판치는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Q3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사업회’를 창립하게 된 계기와 기념사업회를 통해 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종찬 조부인 우당 선생은 행동하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분은 일생 동안 쉼 없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실천하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불살랐지만, 절대 표면에 나서지 않고 이면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서거 당시에도 “○○운동의 이면지도자”(1932년 11월 21일자 중앙일보 기사)로 소개될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당의 행적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 함께 투쟁했던 동지들도 그분의 일면만을 알 뿐 전체적인 그분의 생각과 행동을 조명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스스로가 자신의 행적이나 기록이 알려지길 원치 않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1980년대 들어 과거의 동지들인 정화암, 이정규, 유석현, 이강훈 선생 등 몇몇 분들이 이제 서거 50년이 되었으니 “더 늦기 전에 조각, 조각이라도 모아 기념사업을 해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에서 기념사업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우당은 한국의 아나키스트 운동 초창기부터 참여한 원로이고 아나키스트 운동의 정신 자체가 ‘자유로운 참여와 무언의 실천’에 있기 때문에 기념사업회 활동은 고인의 유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용히 수행해왔습니다.
Q4 우당기념관이 올해 초 재개관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난 8월 3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민국의 길, 자유의 길’이라는 우당 6형제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개막되었는데 전시회의 취지와 시사점은 무엇인지요?
이종찬 우당기념관은 비록 좁고 불비했음에도 그간 우당과 동지들의 활동사를 재조명하는 공간으로 이용되어 왔고, 청소년 역사교실과 독립운동사 교육연구회를 비롯한 집회 장소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닥이나 화장실, 비품 등이 낡아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런 사정을 파악한 보훈처의 소개로 LG에서 수리를 도맡아 기념관을 일신시켜 주었고, 수리 후 재개관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3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막한 ‘민국의 길, 자유의 길’ 전시회는 1900년대 초 일제강점기에 우당 이회영 6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였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대단히 뜻깊은 전시입니다. 서울 출신으로 이른바 ‘삼한갑족(三韓甲族)’이라 일컬어지던 형제들은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시대를 이어 대대로 관계(官界) 요직에 있던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외세의 침략을 당해 민족교육, 무관학교를 세워 저항했고 망명지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자유와 평등사상을 주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6형제 중 성재 이시영 선생을 제외하고 모두 희생되셨습니다. 성재 선생은 저에게 작은 할아버지 되는 분입니다. 홀로 남아 귀국한 성재 선생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주역을 담당하며 올바른 민국의 길, 자유의 길을 선택했던 이 서사시 같은 이야기가 한 가정의 자랑을 넘어 대한민국 ‘공인정신(公人精神)’의 표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5 대일 항쟁기 독립운동가의 후손들 중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국민의 관심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종찬 저는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분들의 후손 중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무언가를 바라는 것처럼 비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독립운동가라면 일제에 맞서 싸울 때 어느 누구도 독립 이후의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땅에 정의로운 사회가 오기만을 소망했을 것인데, 해방 이후 과연 이 땅에 정의 사회가 구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고(故) 박완서 선생은 《오만과 몽상》이란 소설에서 “동학군은 독립투사를 낳고, 독립투사는 집 지키는 수위를 낳고, 수위는 도배장이를 낳는다. 반면 매국노는 친일파를 낳고, 친일파는 탐관오리를 낳고, 탐관오리는 악덕모리배를 낳는다”고 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변을 한 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Q6 국내 일부 논자들이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일 혹은 건국절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종찬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덧칠하더라도 저는 그들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들은 이른바 ‘건국절’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승만 박사를 ‘건국대통령’이라 떠받드는데 정작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건국’을 부인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로 제헌의회가 성립되었고 그 의회의 심의를 통해 7월 12일 제헌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공포한 날은 7월 17일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날이 바로 1392년 조선 왕조가 시작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연속성을 나타내려는 생각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수립의 주역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1948년 제헌 헌법 전문(前文)을 보면 대한민국 건국이라 하지 않고 “기미(己未)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국호(國號)를 승계한다는 뜻에서 재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은 이승만 초대국회의장의 개회식 개회사에서도 언급되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관보(官報) 제1호
의 발행일에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 명시하였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오늘의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한 것이 아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정부 인사들은 모두 “우리는 2차대전 이후 건국한 신생국이 아니라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정통성을 가진 나라로 이제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라는 역사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역사적 정통성에서 벗어난 것이라 지적하면서, 우리도 1948년에 국가 수립을 했다고 한다면 스스로 적손(嫡孫)이 아님을 인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Q7 최근 국내외 정세가 19세기 말~20세기 초 상황과 비슷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종찬 조선 말기인 1880년 일본에 통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청나라 외교관 황쭌셴(黃遵憲)으로부터 《조선책략(朝鮮策略)》이란 전략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然則策朝鮮今日之急務, 莫急於防俄, 防俄之策, 如之何, 曰親中國․結日本․聯美國, 以圖自强而己”(오늘날 조선의 책략은 러시아를 막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결함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따름이다)입니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옛날 《조선책략》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러시아를 막아내는 일(防俄)’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북한의 핵 위협을 해결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책략》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전략이고 지금의 한반도 주변 환경을 감안한 신조선책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황쭌셴의 《조선책략》 결론 부분 중 ‘以圖自强而己’이란 표현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주변 강대국의 힘을 빌려 안보를 보장받으려 해도 결국은 스스로 자강(自强)해야 북의 위협도 해결되고 주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Q8 지난해 설립 10주년을 맞은 동북아역사재단이 해온 역할을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 해야 할 일과 당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종찬 근래에 우리 주변 국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자국 위주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주변국과 역사 갈등이 일어나고 재단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초기에는 주변국의 위압에 눌려서인지 지나치게 방어적이고 타협적인 자세를 보여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균형 감각을 갖고 역사 작업에 나선 결과 최근에는 상당 부분 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주변국이 공격적으로 역사를 연구한다고 우리도 따라간다면 해결은커녕 분쟁만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반문합니다. 때로는 주변국의 공격적인 역사 연구를 보며 우리도 세칭 ‘국뽕’에 빠지지 말자는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대일 항쟁기 당시 백암 박은식, 석주 이상룡, 단재 신채호, 성재 이시영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우리의 역사 체계를 현대적, 과학적으로 다시 정리하여 우리의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스스로 자강의 길을 열면서 역사 연구를 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