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2020년 07월호 뉴스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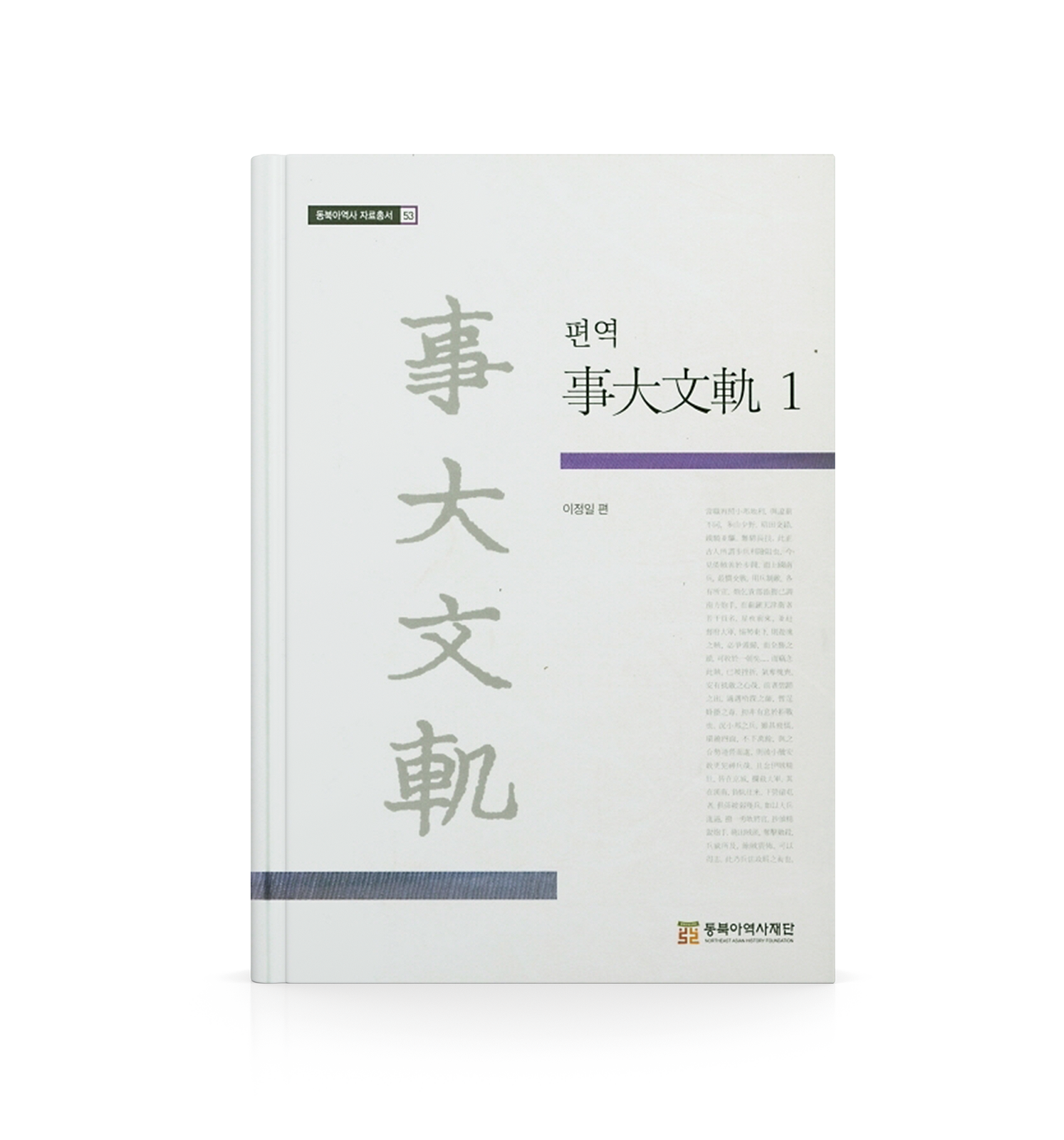
역사 속 동북아 역학 관계를 톺아보다
한중 관계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오늘날 동북아 지역의 정세 변화를 관찰하고 이 지역 국가들 간 상호 인정과 존중의 건설적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주지하듯이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식민사관은 한국사 속 대중(對中) 관계에 있어 외부적 충격을 강조하고 내부적 동력을 배제하며 정체성과 타율성을 부각시켜왔다. 특히 지배와 종속의 패러다임으로 무장한 사대주의론은 19세기 이전 대중 관계뿐 아니라 한국사의 대외 관계 전반을 왜곡하는 중추였다. 해방 이후 한국 학계는 한국사 상 내적 동력원이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를 축적하며 식민사관에 대응해 왔다. 조선 시대 대외관계 연구의 경우 동북아 질서가 상호작용의 메커니즘 속에서 단선적 형태가 아닌 다자 간 복합성, 다층성을 가졌음에 주목함으로써 조선의 대외 정책을 사대 외교 내지는 조공-책봉 제도로 전형화하려는 식민사관의 환원주의적 오류를 지적한 점은 중요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상기 대외관계사 연구의 일보 전진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료의 구축이다. 동북아 정체(政體)들 간 다원적 그리고 중층적 세력 관계를 기록한 다양한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주제별 사료 정리 작업을 통해 당시 동북아 역학 관계의 상호작용을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심화 연구의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재단은 『국역 ‘동문휘고(同文彙考)’』 와 『국역 ‘청계중일한관계사료(淸季中日韓關係史料)’』 등 병자호란 이후 조선 시대 외교 공문서 자료를 집성해 왔다. 이제 발간을 시작한 『편역 ‘事大文軌’』(이하 『사대문궤』)는 임진왜란을 포함하여 병자호란 이전의 약 반 세기 간 조선의 대외 관계를 다룬다. 『사대문궤』는 1593~1608년 사이의 외교 문서가 수록된 기록물로 승문원에서 작성된 외교 문서 사본과 명, 일본, 건주여진, 류쿠 등에서 보내온 외교 문서를 모은 것이다. 본래 54권으로 23권만 현존하지만, 남아있는 문서만 해도 1천 41건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을 갖추고 있다.

조선 시대 대외관계와 사대문궤 국역
사대문궤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들은 『사대문궤』 분량의 반을 넘게 차지하는 임진왜란 관련 자료는 외면한 채, 식민사관의 아류인 만선사관을 합리화하고자 조선과 건주여진이 주고받은 자료만 부각시켰다. 반면 해방 이후 학계는 임진왜란 시기 대명(對明) 관계를 한 축으로 하는 연구와, 임진왜란 직후 대(對)건주여진 관계를 한 축으로 하는 연구 모두에서 『사대문궤』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균형적 사료 활용은 조선의 대외관계를 이념적 화이관 내지는 사대 외교라는 형식주의로 매몰시키지 않고, 동북아 세력 관계의 현실 속에서 재해석하는 데 분수령 역할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대외관계사 연구를 위해서 외교 (공)문서에 대한 분석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을 확대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맥락과 더불어 두 측면에서 재단은 사대문궤의 활용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자 전체 번역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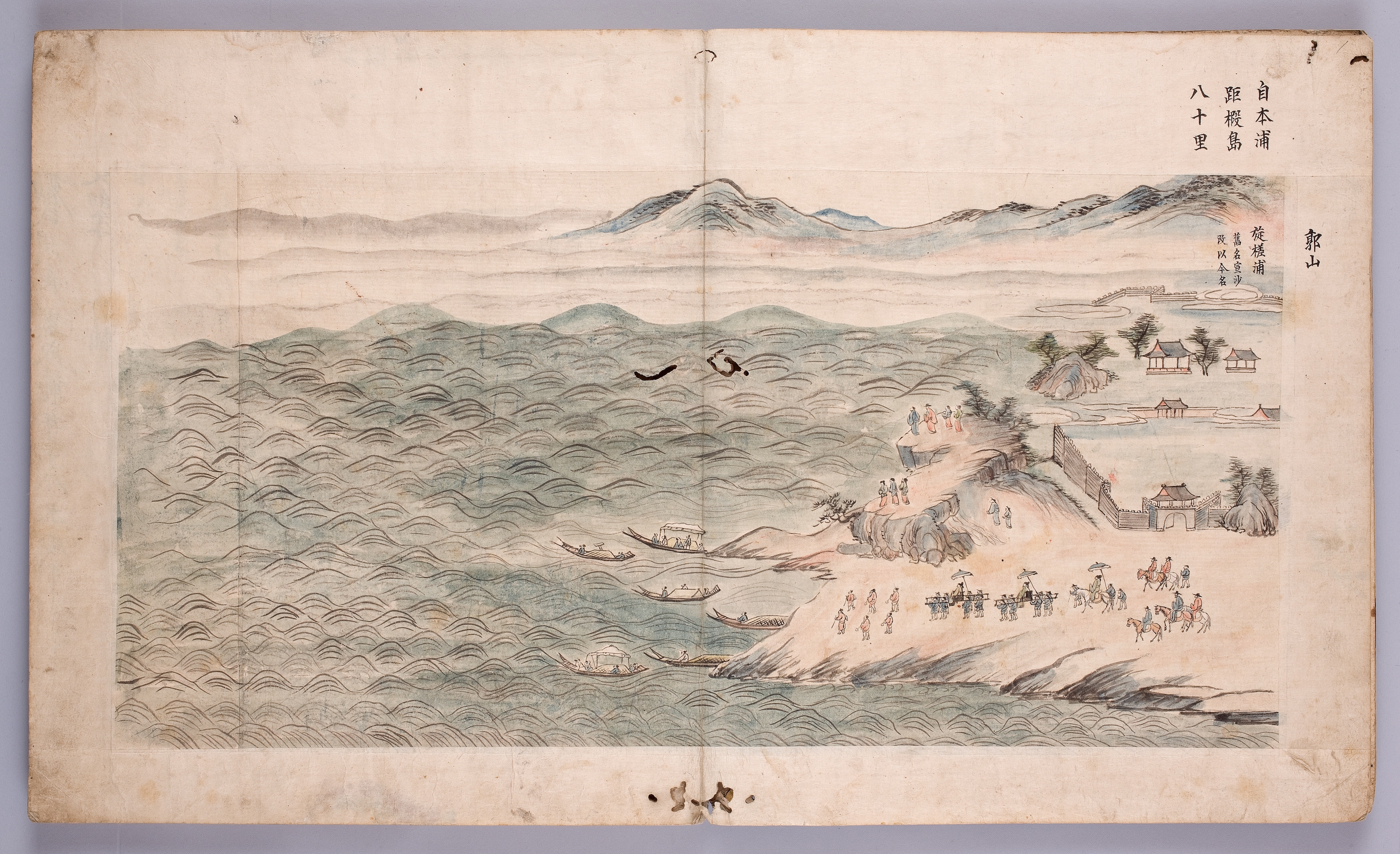
동북아시아 국제 질서 변동과 조선의 외교
먼저, 『사대문궤』 속에는 발신 및 수신 내용을 하나의 세트로 수록한 문서가 상당히 많고, 더욱이 발신이나 수신 측 텍스트 모두 의사 결정에 이르는 행이(行移) 과정을 상대방에게 노출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경우가 다수다. 발신 텍스트에는 어떤 논의 사안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어떻게 제기됐으며, 어떤 라인을 거쳐 그 사안이 어떻게 다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의 요청을 수신 측에 전달하며, 필요 시 수신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를 담고 있기도 하다. 수신 텍스트 역시 발신 측의 내용(요청)이 내부적으로 어느 부서로 전달됐고, 어떤 대책이 세워져 실행됐는가를 적시하여 답신하는 양식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조선과 상대국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 어떻게 논리를 구축하고 의제를 설정하였으며 합의점을 모색해 갔는가를 양측의 입장에서 두루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을 보인다.
또 하나 특기할 바는, 조선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경로를 동원하여 최신의 현장 정보를 수집했고 이 과정에서 자국에 유리한 논리로 개발했는가를 관취할 수 있는 문서들이 수록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외관계에 있어 정보 파악과 수집이 사실 확인이나 전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입장과 논리를 강화하는 외교력에 동원된 주요 기제였음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조선이 명 중심의 역내 질서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이념에 갇히거나 종속의 상하 관계를 추수(追隨)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외교 수사와 현실 외교를 배합하는 전략을 추구했음을 규명하는 하나의 단서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대문궤』에 나타난 상기 두 갈래의 외교 현안에 대한 대처 방식에 대한 주목은, 조선이 국제 관계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생존 전략으로 견지한 대원칙이 자국 안보였음을 이해하고 당시 동북아 지역 질서에 나타난 상호작용성, 전략성, 합리성의 면모를 심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일 것이다.
『사대문궤』의 번역과 활용은 임진왜란과 그 이후 동북아 지역의 외교, 군사, 국방 정책 등을 보다 구조적으로 통찰할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동북아 세력 관계가 다자 간 상호작용에 따라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전개됐음을 밝히는 연구를 확장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재단의 사대문궤 국역 사업은 기존 중국/중화/한족 중심의 지역 질서라는 구도 속에 조선을 포함한 19세기 이전 한국의 대외 관계사를 종속(從屬) 내지는 부속(附屬)으로 몰아넣은 식민주의 역사 해석의 곡학에 대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나아가 동북아 국제 관계사 연구의 외연을 넓히는 데 있어서도 의미 있는 학술 발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