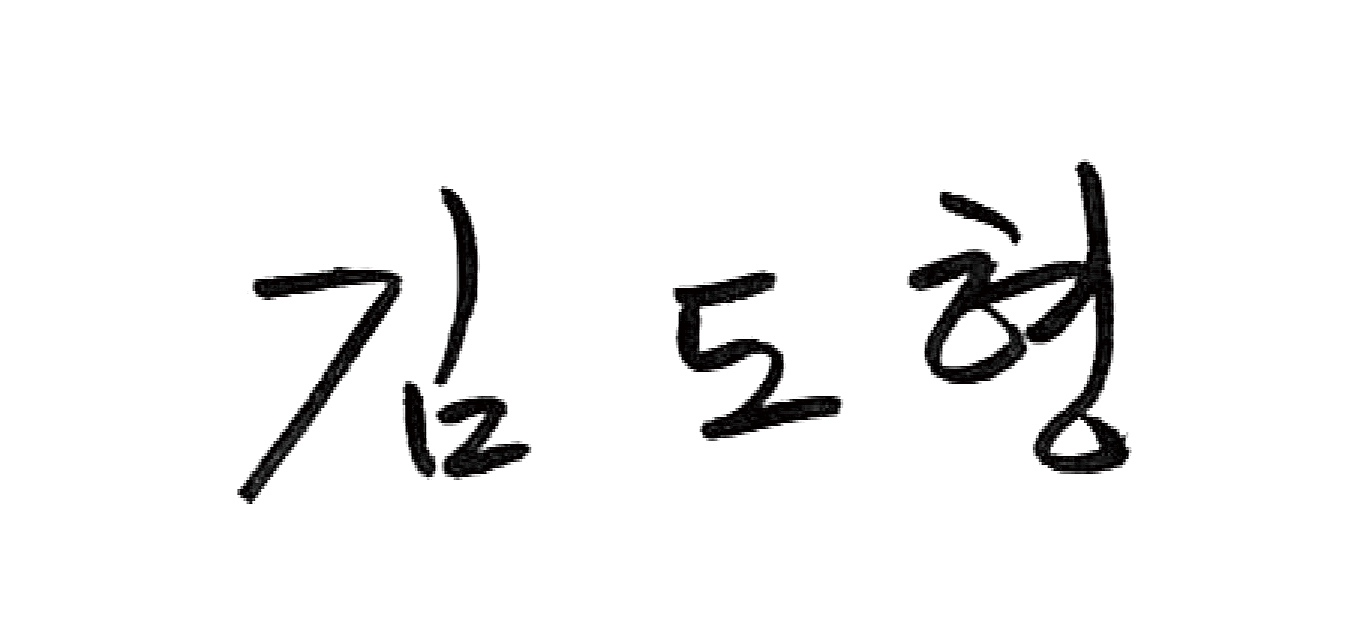동북아역사재단 2020년 01월호 뉴스레터

그 많은 아우성과
그 많은 상실을 남기고
너는 갔다....
아직도 우리에겐 내일이 있어야 한다
가슴과 가슴마다 폭풍이 불어
이만 역사의 노점을 부셔야 한다
인간의 거리와 거리
다함없는 목숨의 노래
여기 얼룩지는 한에 젖으며
또 한 번 해가 바뀐다.
「어느 제야(除夜)에」
한승헌
어릴 때 집에 걸려 있던 시화 속의 한 구절이 생각나는 때입니다. 새해를 맞으면 우리는 많은 생각에 잠깁니다. 대개 세월은 너무 빠른데 이룬 것이 없다는 회한悔恨과 올해는 좀 더 멋지고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생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모양입니다.
문헌에는 빠른 세월에 대한 감회를 적은 글들이 많습니다. 소동파(蘇東坡)는 「제야에 상주의 성외에서 야숙하며」라는 시에서 새해에 마시는 도소주(屠蘇酒)를 나이 순서에 따라 젊은 사람보다 나중에 마시는 가련한 느낌(自憐後飮屠蘇者)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조선 광해군 시절(1616)의 과거 시험에도 이러한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새해가 오는 것을 다투어 기뻐하지만, 점차 나이를 먹으면 모두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세월이 흘러감을 탄식하는 데 대한 그대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
광해군의 책문(策問)에 대책문을 쓴 이명한(1595-1645)은 “그 해가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은 늙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라고 분석하며, 동시에 다른 각오를 표현했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쉼 없이 정진한다면 빠른 세월과 나이가 든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할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근거로 스스로 마음에 경계합니다. ‘세월은 이처럼 빨리 지나가고,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는다. 죽을 때가 되어서도 남들에게 칭송받을 일을 하지 못함을 성인은 싫어했다. 살아서는 볼만한 것이 없고 죽어서는 전해지는 것이 없다면, 초목이 시드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새해에 다짐하는 것은 각자 원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것을 목표로 자신을 변화시키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나이가 드는 것만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세월에, 그리고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곧 ‘수시변역(隨時變易)’입니다.
자연계는 물론이고 사람이 행한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자연계나 인간계의 변화 원리를 규명하는 것이 바로 학문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은 물론이고 사회과학, 자연과학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역사학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사회 변화는 혁명처럼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이룹니다. 급격한 변화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수많은 작은 변화들이 모여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추운 겨울의 음(陰) 기운 속에서도 아주 적은 양(陽)의 기운이 조금씩 커져서 봄이 되듯, 때에 따라(時宜) 변화합니다. 인간사의 변화 또한 때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변화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는 가만히 있으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야 합니다. 인간사, 조직, 역사 모두가 그렇습니다. 변화의 원리를 정리한 『주역』에는 이를 ‘궁즉통(窮則通)’으로 설명합니다. “역(易, 바뀜)이란 것은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한 후에 오래가는 건, 다시 세월이 흐르면 궁하게 됩니다. 심지어 바꿀 수 없다는 ‘조종의 법(朝宗之法)’ 조차 폐단이 생기게 됩니다(法久弊生). 이런 때에 이르면 많은 개혁가, 정치가(왕안석, 강유위, 이이, 박은식 등)들은 ‘변법(變法)’ 개혁을 주장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려는 사람이나 집단, 민족은 결국 파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역사 속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에는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말 일제하, 역사학을 통해 민족운동을 하던 박은식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자세에 대해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을 예로 들었습니다. 『열자(列子)』 탕문(湯問)편에 나오는 우공이산(愚公移山)과 과보축일(夸父逐日)입니다. 우공은 큰 산을 옮기는 일을 자신이 시작했지만, 후대에 이르도록 이어가서 마침내 완수한다는 것이고, 이에 비해 과보는 자신의 힘과 용기만 믿고 해와 겨루었다가 결국 목이 말라 죽는 얘기입니다. 박은식은 독립운동조차 ‘우공이산’의 자세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변화와 혁신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조직의 제도나 관행은 시세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재단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두가 조금이라도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해 결과를 얻고, 또 다시 새해를 맞을 때에는 후회하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경자년 ‘쥐’의 해라서 그런지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글귀가 생각납니다.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쳐도 쥐 한 마리밖에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태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쥐 한 마리도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판단은 차후에 하더라도, 태산이 울고 요동칠만한 원대한 꿈을 꾸고 변화를 꾀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경자년 원단(元旦)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 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