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2018년 10월호 뉴스레터
- 임상선( 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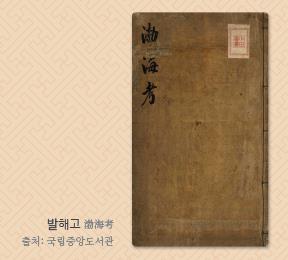
유득공(柳得恭,1748~1807)은 한시사대가(漢詩四大家)의 한사람으로 『발해고(渤海考)』를 저술한 역사가였다. 그의 8대조는 광해군의 장인인 유자신(柳自新)이었으나,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고, 1628년에는 광해군 복위 사건에 연루되면서 집안이 큰 타격을 입었다. 증조부 유삼익이 서자였고 조부는 유한상(1707~1770), 조모는 신흠(申欽)의 후손인 평산 신씨이며, 부는 유춘(1726~1752), 모는 평안도병마절도사 홍시주의 서자로 이원현감을 지낸 남양 홍씨 이석의 딸이었다. 유득공은 16세에 전주 이씨와 혼인하고, 그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장남인 본학(1770~1842)은 파평 윤씨 가기(尹可基)의 딸과, 차남인 본예(1777~1842)는 한치윤(韓致奫,1765~1814)의 맏형 한치규의 딸과 각각 혼인하였으며, 두 아들은 아버지에 이어 모두 검서관(檢書官)을 역임하였다. 차녀는 성해응의 조카인 창녕 성씨 익중(成翼曾)과 결혼하였다.
유득공은 부모가 결혼한 지 8년만인 1748년 경기도 남양 백곡(白谷) 외가에서 태어나 한양에서 생활하였다. 그의 나이 5세에 부친이 27세로 별세하고, 7세에 어머니를 따라 외가인 백곡으로 갔다가 13세에 다시 돌아왔다. 어머니는 경행방오늘날 서울 종로구 경운동 일대에서 삯바느질을 하였다. 포천, 양근, 풍천 등지의 관직 생활을 제외하고 대부분 오늘날 중구 명동, 회현동, 소공동, 서소문동 일대에서 살았으며, 1807년 60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양주(楊州) 송산 선영에 묻혔으나, 현재는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분두골 동쪽의 선산에 옮겨 모셔져 있다.
지식의 소통과 공유
유득공은 오늘날 탑골공원 주변에 살던 박지원(1737~1805)을 비롯하여 성대중(1732~1809)과 아들인 성해응(1760~1839), 서상수(1735~1793), 이덕무(1741~1793), 박제가(1750~1805), 이서구(1754~1825) 등과 학문적으로 교류하며 생을 함께하였다. 이들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유득공이 상대편의 서문을 써주고, 반대로 자신의 저작에 이들의 글을 받은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득공이 써준 서문에는 성대중이 편한 『일동창화집』(1763), 이서구의 『호산음고』(1776), 이덕무의 『청비록』(1778), 박지원의 『열하일기』(1780), 이덕무 편 『청령국지』(1793), 한치윤의 『해동역사』(1805~1806) 등이 있다. 유득공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서문으로는 박제가 「유혜풍시집서」(1776), 박지원의 「영재집서」(1778), 성해응과 이덕무의 「열하기행시주(熱河紀行詩註)」(일명 난양록(灤陽錄)이라 함), 그리고 박제가의 「발해고 서」(1785)와 성해응의 「발해고 서」 등이 있다.
유득공의 청나라 여행

유득공이 처음으로 중국 사행에 나선 것은 31세 때인 1778년(정조 2)이다. 같은 해 7월 심양에 있는 능묘를 보러 오는 건륭제를 문안하러 가는 사신단의 일원으로 윤 6월 26일 서울을 떠났다. 유득공이 당시 얼마나 중국으로의 여행을 바랐는지를 전하는 에피소드가 있다. 유득공은 같은 해 3월, 정사 채제공을 따라 연경에 갔다가 돌아오던 박제가와 이덕무를 개성에서 만나 “멀고 가깝고 빠르고 느린 것을 왜 묻는가, 어쨌든 압록강만 건너면 되지 않는가”(『영재집(泠齋集)』권3)라는 시를 지었다. 이덕무와 박제가가 사행지인 연경과 심양을 비교하며 놀리자, 유득공이 자신의 심정을 말한 것이었다.
유득공은 심양 사행의 기록을 『읍루여필(挹婁旅筆)』(『영재집』권7)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했는데, 이는 심양이 과거 읍루국이 있던 곳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이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기록은 서문만 남아 전해지고 있다.
유득공은 17세기 초 심양의 한인들이 청의 침입에 저항하지 못하고 굴복한 결과 변발을 하고 만주족의 옷을 입게 되었던 것인데, 당시 이 지역 선비들이 조선 사신의 갓과 옷을 부러워하는 것은 앞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는 43세 때인 1790년(정조 14) 5월 박제가·이희경과 함께 건륭제의 팔순절 축하 사절의 일원으로 북경은 물론 열하(熱河)도 다녀 왔다. 이 사행의 기록이 『열하기행시주』이다.
유득공은 사행 중 많은 명사들과 교제했는데, 이때 사고전서 편찬을 담당하던 당시 예부상서 기윤(紀昀)의 집(북경 유리창 부근)을 박제가와 함께 방문하였고, 기윤이 몸소 유득공이 머물고 있던 관사를 찾아오기도 하였다. 한편, 유득공은 만주족에 대한 한족 인사들의 편견을 비판하였다. 열하에 있을 때 만주 정황기인(正黃旗人)인 복건장군으로부터 흰 부채에 시와 낙관을 받았는데, 이것을 본 연경의 명사들이 좋지 않다고 평하였다. 유득공은 복건장군이 인물됨이 걸출하니 비웃지 말라고 하며 자신은 동단엽기도(東丹獵騎圖)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유득공은 복건장군의 성이 완안(完顔)인 것에서 그가 ‘금나라의 후예’임을 알았을 것이고, 그가 그려준 그림을 동단왕(동단국왕 야율배를 말함)이 말 타고 사냥하는 그림에 비유하며 호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54세 때인 1801년(순조 1) 주자서 선본을 구해오라는 어명을 받고, 박제가가 참여한 사신단을 뒤쫓아 연경에 다녀왔다. 이때 연경에 두 번째 갔다는 의미에서 사행 기록을 『연대재유록(燕臺再遊錄)』이라 하였다. 유득공은 당시 청나라 문인들과 문답할 때 대부분 한어(漢語)를 사용하고 혹 필담으로 하였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21세의 조강(曹江)이라는 인물이 유득공에게 “그대가 종을 부를 적에는 ‘이융납(伊隆納,‘이리 오너라’의 음차인 듯)’이라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가요” 라고 물으니, 유득공은 “그대가 종을 부를 적에 ‘래아(來啊)’라 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답하였다. 유득공은 진삼(陳森)이라는 화가가 그린 자신의 초상화도 받아 왔다. 진삼은 유득공에게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차를 마시며 돌아보고 웃으며 말을 하라 하고, 이러한 모습의 유득공이 매화 아래 돌에 걸터앉아 글을 보는 초상화(梅花踞石看書圖)를 그렸다고 한다.
유득공에 대한 올바른 평가 - 자료의 종합, 연구
유득공은 발해사가 한국사임을 남북국이라는 논리로 명백히 설명하고, 조선과 청을 넘어 동남아시아, 몽골 등까지도 시야에 담은 국제인이었다. 오늘날 유득공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파악이나 연구가 충분하지는 않다.
우리 역사와 문학, 지리, 민속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작성한 각종 저술의 목록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유본예가 그렸다는 『연행시화(燕行詩畵)』를 비롯하여 유득공의 초상화도 찾지 못했다. 유득공에 대한 종합적이고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종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 정리, 편찬, 그리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