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2018년 10월호 뉴스레터
2019년은 정혜공주묘지를 발견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다. 묘지(墓誌)란 죽은 사람의 이름, 신분, 행적 따위를 새긴 글을 말한다. 서기 780년에 만주 벌판 구석의 무덤에 묻혀 세월의 연륜을 새겨오다 1269년 만에 세상에 알려지게 된 셈이다. 이 묘지는 발해사 연구의 귀중한 보물로 인정받기도 했지만 수많은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정혜공주묘지 발견 70주년을 맞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문서 자료와 함께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 현황을 소개하고 남은 과제들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정혜공주묘지 개관
먼저 한국에서 정혜공주묘지에 대해 잘 정리된 글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정혜공주는 3대 문왕의 둘째 딸로서, 737년에 태어나 777년 4월에 40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그 무덤은 현재 길림성 돈화시 강동향 승리촌 육정산(吉林省 敦化市 江東鄕 勝利村 六頂山) 고분군 안에 있다. 이 무덤은 제1고분군의 중앙에 위치하며 그 편호는 IM2호이다. 1949년 연변대학에서 발굴한 바 있고, 1959년에 다시 조사되었다.
묘지가 새겨진 묘비는 1949년 발굴 시에 연도 안에서 7조각으로 깨진 채 발견되었다. 이 비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위가 뾰족하고 아래는 네모진 규형(圭形)의 형태를 띠고 있다. 크기는 높이 90cm, 너비 49cm, 두께 29cm이다. 앞면에는 해서체(楷書體)로 비문을 음각하였다. 비문은 21행으로 마지막 행에는 정효공주묘지(墓誌)와 달리 비를 세운 연월일이 새겨져 있다. 전문 725자 중에서 491자는 명확하게 판독할 수 있고, 나머지 글자는 1980년 정효공주 묘비가 발견됨에 따라 모두 보충할 수 있게 되었다. 비문 주위에는 당초문唐草文을 둘렀고, 윗부분에는 구름무늬를 새겼다. 이 비는 현재 길림성 장춘시 길림성박물관현재 길림성박물원에 소장되어 있다.
두 공주의 묘지를 비교해보면, 생애와 관련된 6곳만이 서로 다를 뿐이다. 그 비교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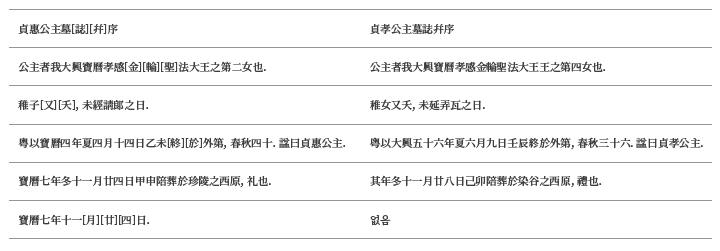
비문은 전형적인 변려체(騈儷體) 문장으로서, 13행의 서문과 6행의 명문 및 마지막 행의 비석을 세운 연월일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문의 내용 구성과 해독, 주석에 대해서는 정효공주 묘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 묘비는 정효공주의 것과 함께 발해인이 남긴 아주 진귀한 사료이다. 특히 발해 초기 역사를 규명하는 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우선 이 묘비가 발견됨에 따라 육정산(六頂山) 고분군이 발해 초기의 왕실, 귀족들이 배장된 곳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초기 도읍지였던 동모산(東牟山) 지역이 바로 돈화시(敦化市) 일대라는 것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성산자산성(城山子山城)이 대조영이 동모산에 축성하였다고 하는 산성으로 비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문헌 기록에는 없는 발해 문왕(文王)대의 몇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문왕의 존호가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완전한 명칭은 정효공주 묘비가 발견됨으로써 비로소 확인되었다. 둘째, ‘보력(寶曆)’은 문왕대의 연호로서 대흥(大興) 37년774에 개원된 것이라는 것이 규명되었다. 이것도 정효공주 묘비가 발견됨으로써 말년에 다시 대흥으로 복귀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정혜공주가 배장된 진릉(珍陵)은 2대 무왕 대무예(大武藝)의 무덤으로 추정되며, 구체적으로는 제1고분군 중에서 IM6호분으로 여겨지나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넷째, 공주는 보력 4년 4월 14일에 사망하여 보력 7년 11월 24일에 배장되었으므로, 3년장을 치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고구려의 3년장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다섯째, 비문에 ‘공주(公主)’, ‘동궁(東宮)’, ‘릉(陵)’ 등의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발해에서도 외명부제(外命婦制), 동궁제(東宮制), 능묘제(陵墓制)가 시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송기호, 1992, 『정혜공주묘지(貞惠公主墓誌)』, 『역주 한국고대금석문(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3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정혜공주묘지에 대한 위의 개관문은
1992년 송기호 교수의 글이다. 송 교수는 1981년에
「발해 정혜공주묘비의 고증에 대하여」『한국문화』2,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라는 글을 발표하였고, 1992년 시점에서 옌완장(閻萬章),
진위푸(金毓黻), 시마다 마사오(島田正郞), 왕젠쥔(王健群), 왕청리(王承禮), 루오지주(羅繼祖), 왕샤(王俠), 채희국, 방학봉 등 선학의 연구를 참조하여 쓴 글이다.
정혜공주묘지에 대한 위의 개관문은
1992년 송기호 교수의 글이다. 송 교수는 1981년에
「발해 정혜공주묘비의 고증에 대하여」『한국문화』2,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라는 글을 발표하였고, 1992년 시점에서 옌완장(閻萬章),
진위푸(金毓黻), 시마다 마사오(島田正郞), 왕젠쥔(王健群), 왕청리(王承禮), 루오지주(羅繼祖), 왕샤(王俠), 채희국, 방학봉 등 선학의 연구를 참조하여 쓴 글이다.
위의 개관문에서도 나오지만 1980년 화룡시 용두산 고분군 정효공주묘지가 발견됨에 따라 정혜공주묘지에서 판독할 수 없던 글을 모두 보충할 수 있었다. 이는 발해사 연구의 이정표가 되었으며, 발해 금석문을 포함한 기타 영역 연구에서 크나큰 진척을 이루었다.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해에 한국에서 정혜공주묘지에 대해 이만큼 정리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다. 예를 들어 1949년 연변대학에서 묘지를 처음 발굴하였다는 사실, 정혜공주묘지가 육정산 고분군에 위치한 발해 초기의 귀족 무덤이라는 것, 돈화의 성산자산성이 발해의 동모산일 가능성이 확정된 것, 정혜공주가 배장된 동쪽의 진릉(珍陵)은 2대 무왕 대무예의 무덤으로 추정된다는 것, 그리고 고구려 전통인 3년장을 치렀다는 것 등이다. 그런데 필자는 연변대학에서 근무하며 위의 인식에 대하여 재고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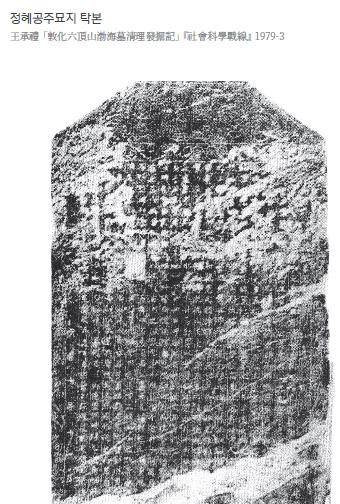
위의 개관문을 포함하여 발해 학계는 1949년 연변대학이 육정산 고분군을 발굴하며 정혜공주묘지를 처음 발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당시 발굴에 참여했던 연변대학 역사과 1기생인 방학봉 교수의 회고문에는 ‘오봉협(吴凤协)과 1949년 9월에 돈화현에 들어가서 발굴했다’고 나올 뿐이다. 1958년 옌완장(閻萬章)은 ‘연변대에 가서 조사하고 묘비를 고증하였다’고 하였으며, 1979년 왕청리(王承禮)는 연변대학의 정리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1949년 연변대학 역사과 학생들이 어떤 조사를 했고, 어떤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하여서는 학계가 거의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2017년 우연한 기회에 연변대학 당안관문서보관국과 의논할 기회가 있어 오봉협이라는 인물에 대한 문서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오봉협이 남긴 문서 중 『돈화고적고(敦化古蹟考)』1951라는 책을 읽으며 1949년 연변대학이 돈화 육정산 고분군을 발굴한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기존 왕청리의 글을 통해 1960년대 이전의 발굴 상황을 알 수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49년도에 어느 유적을 발굴했고, 어느 유물이 어느 장소에서 발굴되었는지는 모르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오봉협의 문서를 통해 어느 유물이 어느 무덤에서 발견되었는지, 처음 정혜공주묘지를 발견했을 때 어떤 형태였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돈화고적고』를 작성하며 정혜공주 묘지명에 사용된 용어를 중국 고전에서 면밀히 조사하였던 흔적도 보이며, 동쪽에 있는 고분을 진릉(珍陵)으로 보는 등 학계에서는 옌완장과 진위푸가 내세운 주장이라고 알았던 것이 실은 연변대학의 오봉협 선생이 처음 제기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돈화고적고』의 발견이 발해사에 대한 인식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정혜공주묘지를 처음 발굴한 학자의 인식이 어떠하였는지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료라 할 수 있다.
정혜공주묘지를 둘러싼 중국학계 발해사 연구의 새로운 동향
정혜공주묘지의 발견은 서기 780년 경의 발해 역사 규명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다. 묘지가 발견됨에 따라 육정산 고분군이 발해 초기의 왕실과 귀족이 매장된 곳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초기 도읍지였던 동모산 지역이 돈화시 일대임이 확정되었다. 이런 의견을 처음 제시한 분은 돈화문물관리소에 근무했던 류쫑이(劉忠義)로, 그의 글 ‘동모산은 어디에 있는가’『학습과 탐색』,1982-4가 발표된 후 돈화 일대를 발해의 구국(舊國)으로, 성산자산성을 발해의 건국지 동모산으로 보아왔다. 이에 중국 길림대학 변강고고연구중심은 발해 건국지의 고고학적 흔적을 규명하고자 2000년부터 돈화 일대의 오동성, 영승 유적 등을 전면적으로 발굴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발해 유물은 발견하지 못하고 요금 시기 유물만 발견하였다. 그리고 정혜공주묘가 위치한 육정산 고분군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발굴 조사한 끝에 235기의 무덤을 확인하여 235기의 무덤을 조사한 결과 육정산 고분군은 주로 흙무덤이었고, 석실분은 동서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는 서쪽 1구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석실의 경우 다양한 형식을 보였다. 정혜공주묘지에만 의거하여 발해 동모산 내지 구국을 돈화 일대에서 찾는 것 자체가 논리성을 잃게 되었다.
정혜공주묘지에서 또 한 가지 논란을 일으켰던 것은 ‘진릉’ 문제다. ‘진릉의 서쪽 언덕에 배장하였으니, 예의로다.(陪葬於珍陵之西原), (礼也).’라는 구절과 관련하여 진릉을 제2대왕 무왕(武王)의 무덤, 제3대왕 문왕(文王)의 무덤으로 보는 견해, 그리고 1구역의 6호 무덤으로 보는 견해, 2구역의 무덤으로 보는 견해 등 여러 가지 설이 발전해 왔다. 그런데 2004년부터 용두산 고분군 발굴 조사 결과에 따라 왕페이신(王培新)이나 류샤오둥(劉曉東)교수는 ‘진릉’을 용두산 고분군 전체에 대한 지명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중국 학계는 정혜공주와 고구려와의 관계에 대해 육정산 고분군과 고구려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해 왔다. 하지만 다무라 코이치(田村晃一)가 발표한 ‘정혜공주는 고구려인에게 시집갔다’는 내용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육정산 고분군에서 발견된 와당이 고구려의 와당 형태와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정혜공주가 위치한 1구역의 석실분이 고구려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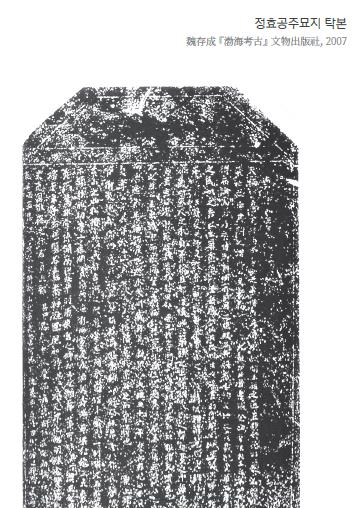
정혜공주묘지가 발견된 지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간 묘지명 연구는 정효공주묘지 발견, 기타 유적·유물의 발견으로 인해 크나큰 진척을 이루었다. 그러나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정혜공주묘를 포함하여 육정산 고분군에 대한 역대 발굴 조사와 관련된 일지 자료나 기록 문서를 발굴하는 일이다. 그간에는 이미 간행된 발굴 보고에만 매달리다 보니 발굴 시의 수많은 정보를 소홀히 하였던 것 같다. 이는 1949년 당시 연변대학 이 육정산 고분군에 대하여 발굴 조사한 내용에 관한 문서 자료를 접하며 새삼 느낀 점이다.
두 번째는 정혜공주 무덤 주변 유적, 나아가 발해 영역 속 전체 유적에 대한 조사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다. 중국 학계에서는 돈화 일대에 발해 유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정혜공주의 무덤이 돈화 육정산 고분군에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정혜공주와 고구려인과의 혼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육정산 고분군과 8세기 후반 발해의 관계가 밀접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돈화 일대, 나아가 그 주변 지역 유적에 대한 조사는 끊임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선행 연구 성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정혜공주묘지 하나만 보더라도 선행 연구에서는 깔끔한 탁본 한 장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중국 학계와 연동하면서 미공개 자료를 공개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1269년 만에 빛을 본 발해 정혜공주묘지 발견은 문헌 사료가 극빈한 발해사 연구에 크나큰 힘을 주었다. 70년간 수많은 논쟁과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발해사 연구를 진척시켰다. 더 많은 발해 묘지가 발견되고 공개되기를 기원하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