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2023년 12월호 뉴스레터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기념관
이 글의 목적은 미국 대학에서 널리 쓰이는 ‘미국역사’ 교재의 한국전쟁 서술 내용을 분석하여 미국 사회의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학계의 한국전쟁 연구 경향을 검토하고, 학계의 연구가 미국 대학들의 ‘미국역사’ 교재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미국 내 한국전쟁의 사학사
미국 역사가들의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 중 대부분은 전쟁의 발발과 기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쟁의 발발은 선제공격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에 관해서 한국의 연구자 김태우는 「한국전쟁 연구 동향의 변화와 과제, 1950~2015」(2015)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현재 [국내외의] 학계에서는 최소한 전쟁 발발의 주체와 관련된 논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누구도 더 이상 북한의 선제 남침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전쟁의 기원문제는 전쟁의 원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한국전쟁을 국제적인 냉전의 일부로 해석하는 것이다. 즉, 소련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국제적인 공산주의 세력이 북한을 부추겨 남침하게 했고,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유엔군의 일부로 참전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전쟁은 1945년 이후 남한과 북한의 내전이 연속 또는 확대되었다는 내전론(Civil War)이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냉전론과 내전론을 적당히 섞은 복합적 해석이다. 즉, 한국전쟁은 내전의 성격이 있지만 국제적인 냉전체제에서 계획되었고 실행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학자들이 국제적인 관점을 중요시하든지 아니면 내전적인 성격을 강조하든지, 결국 이들은 한국전쟁의 원인과 발발 문제를 가장 주의깊게 연구하였다. 그에 반해 미국에서 출판된 연구 중 한국의 연구자들이 최근 주목하고 있는 민간인 학살 문제 연구는 아주 적다. 또한 한국 학계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한국전쟁과 여성, 한국전쟁으로 인한 한국 사회구조와 의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계급구조 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전쟁과 종교, 남북한 점령 정책에 관한 연구 역시 미국학계에서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그런데 2015년 김태우의 논문에서 다루지 못했던 그 이후의 연구에서는 주제가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전쟁의 발발이나 기원보다는 그 전쟁의 국제적 영향이나 혹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에 집중한다. 2015년에 출간된 하지무 마스다(Hajimu Masuda)의 책 Cold War Crucible, 2019년 출간된 사무엘 웰스(Samuel F. Wells, Jr.)의 Fearing the Worst와 모니카 김(Monica Kim)의 The Interrogation Rooms of the Korean War, 그리고 2020년에 출판된 찰스 핸리(Charles Hanley)의Ghost Flames: Life and Death in a Hidden War(Korea 1950-1953) 등이 좋은 예이다.
<종이로 출판된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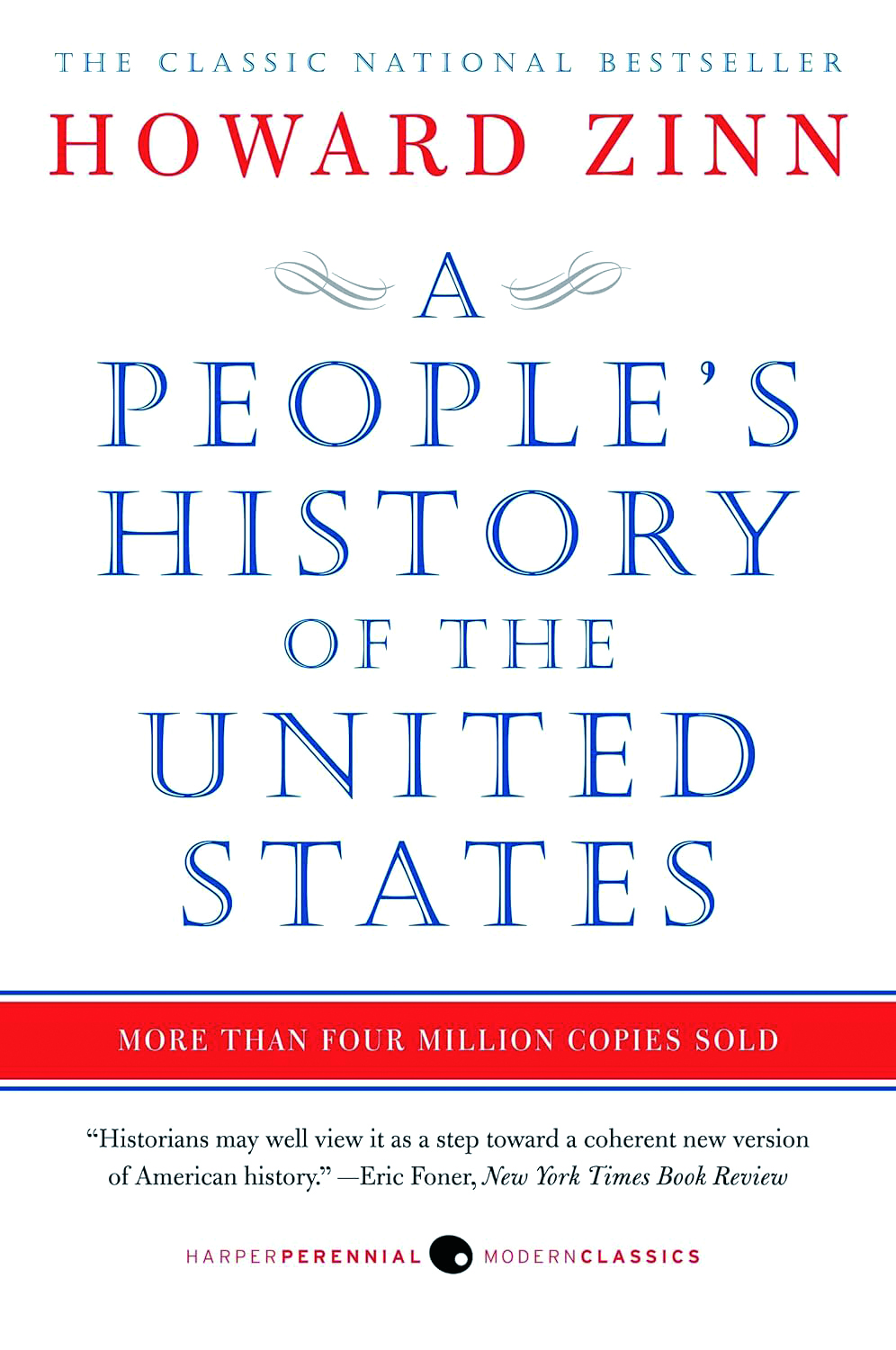
Zinn, Howard.
A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980), 42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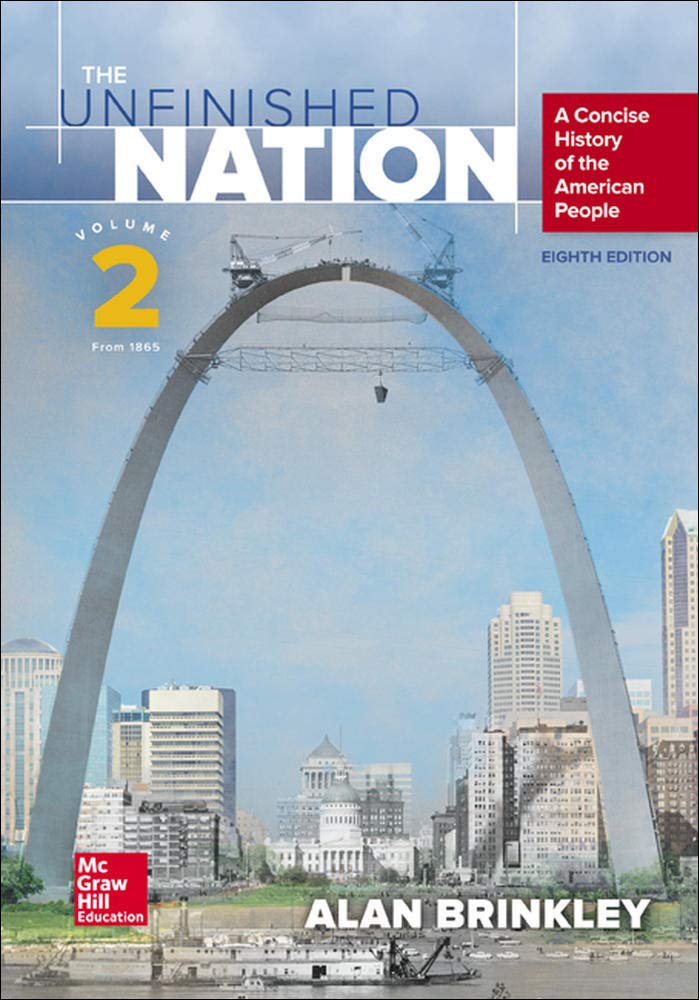
Brinkley, Alan. The Unfinished Nation:
A Concise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Eighth Edition 2 (2016),
66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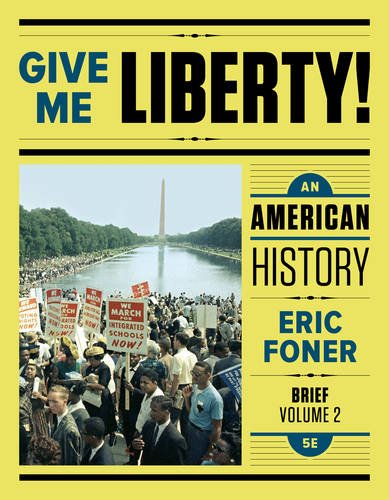
Foner, Eric.
Give Me Liberty!: An American History.
Fifth Edition 2 (2017), 91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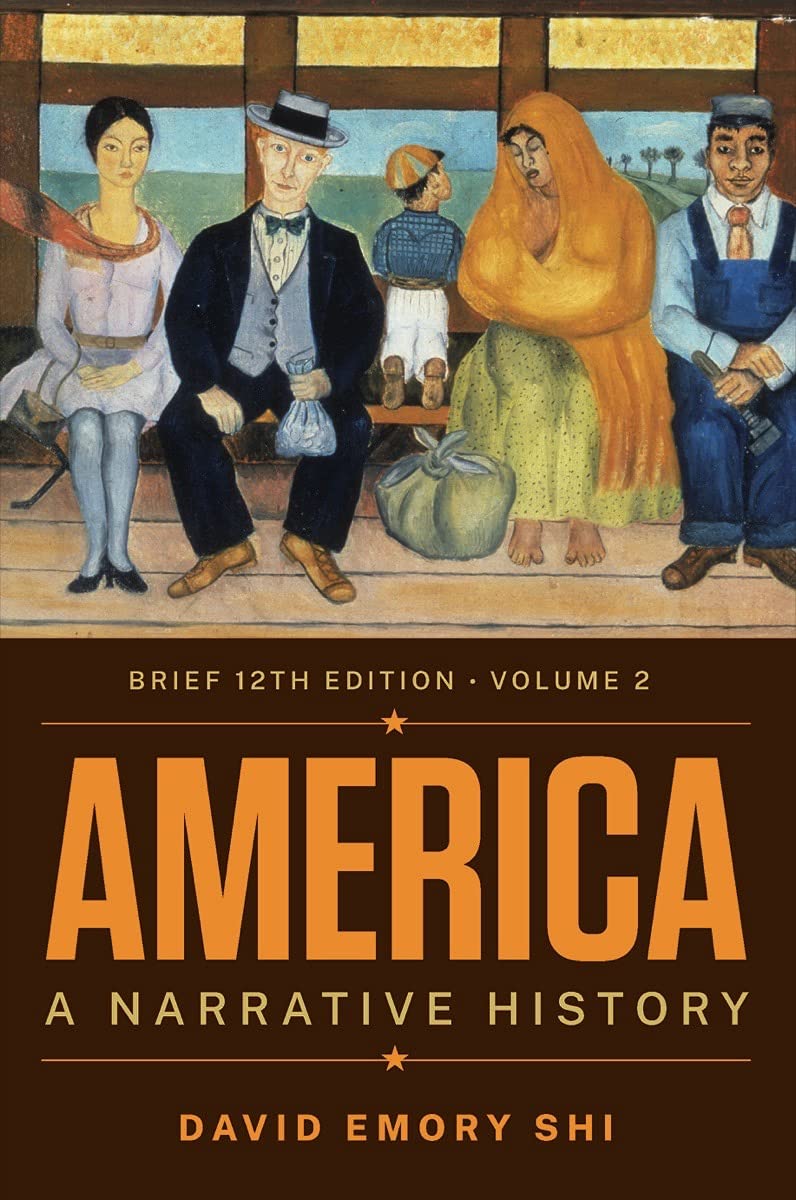
Shi, David Emory.
America: A Narrative History.
12th Brief Edition 2 (2022),
1118-1123.
<무료전자책으로 출판된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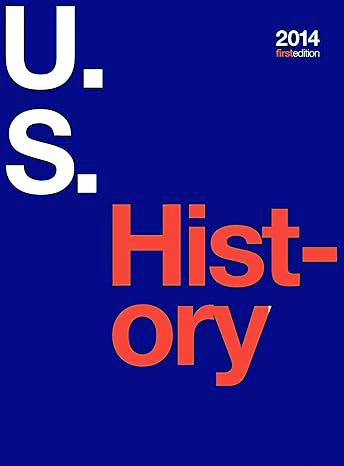
Corbett, P. Scott. et. al.,
U.S. History (2017),
Vol. 2, 83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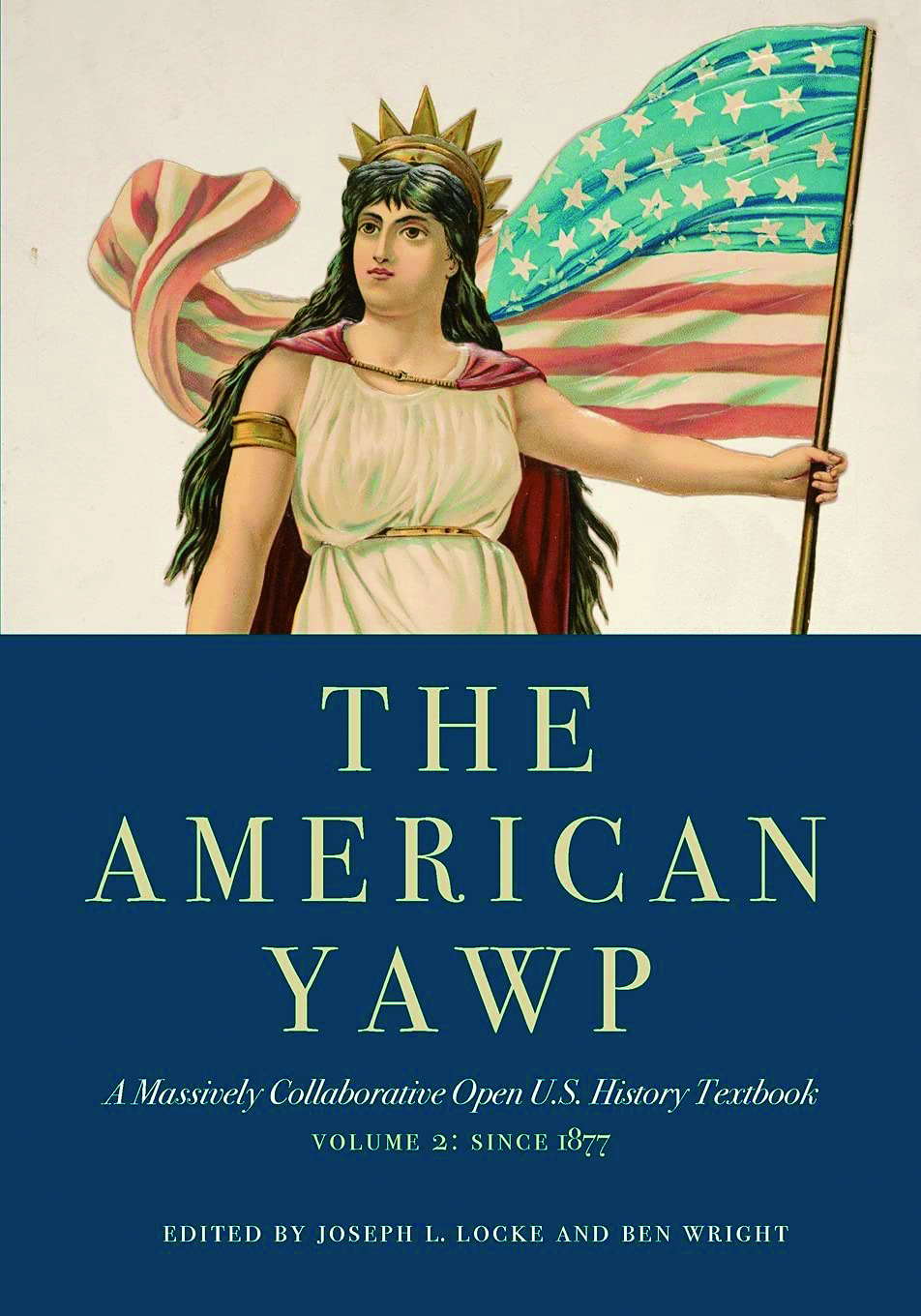
Locke, Joseph L. and Ben Wright, eds.
The American Yawp (2019),
Vol. 2, 264-65.
한국전쟁과 미국 대학의 미국사 교과서
이에 반해 미국의 대학 교과서에서는 아직도 한국전쟁의 기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과서는 한국전쟁을 냉전과 내전의 성격이 섞인 복합적인 전쟁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의 대학 교과서에서 한국전쟁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관한 한국 내의 연구는 없다. 오직 유사한 것으로서 정재윤이 2020년에 발표한 영국의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 연구이다. 미국 내에도 이런 연구는 없고 단지 1990년에 미국의 학자 댄 플레밍과 버튼 카우프만(Dan B. Fleming and Burton Kaufman)이 버지니아주에서 쓰이고 있는 12종의 고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2쪽 분량의 보고서가 있을 뿐이다. 미국의 대학 교과서에 기술된 한국전쟁에 관한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 다음의 교과서들을 검토하였다.
종이책으로 쓰인 4종의 책은 하워드 진(Howard Zinn)의 책을 제외하고는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진의 책은 오래전에 출판되어 비록 많은 대학에서 채택하지 않았지만 그 독특한 시각 때문에 절판이 되지 않고 꾸준히 쓰이고 있어서 비교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그리고 전자책으로 출판된 2종의 책은 많은 교수들과 유명 대학들이 협력하여 출판하였으며,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내용도 좋아 점점 많은 대학에서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대학 교과서들에 나타난 한국전쟁에 대한 기술은 형식상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다루고 있는 주제가 거의 비슷하다. 우선 한국전쟁의 발발 배경과 원인을 기술하고 있고, 그 다음 전쟁의 전개를 다루고 있다. 전쟁의 전개에 서도 모든 책이 1950년 6월 25일의 북한의 기습 남침과 유엔군의 낙동강 방어선까지의 일방적 패퇴, 같은 해 9월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s MacArthur)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을 통한 유엔군의 반격과 북진, 그리고 같은 해 11월 중순 중국군의 참전으로 인한 유엔군의 후퇴, 그리고 1951년 1월부터 시작된 유엔군의 재반격과 38선을 중심으로 한 전선의 고착, 1951년 6월부터 시작해서 2년을 끈 정전 협상과 1953년 7월 27일의 정전
협정을 다루고 있다.
둘째, 주제가 비슷한 것은 미국 대학 교과서에서 한국전쟁에 할당된 분량이 극히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위의 책들은 한국전쟁에 1~6쪽을 할애했는데 평균 4쪽이다. 더욱이 위의 모든 교과서가 한국전쟁의 진행 상황을 그린 한반도 지도나 사진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를 감안하면 실제 서술은 1 ~ 5쪽에 불과하다.
셋째, 한국전쟁에 관한 서술이 적은 분량임에도, 진의 책을 제외한 모든 책들은 한국전쟁의 발발과 전개라는 두 소주제로 분량을 거의 정확히 반분하고 있다. 시(Shi)의 책은 3쪽씩, 브린클리는 반쪽씩, 포너와 로크는 1문단씩, 코르베트는 2문단씩으로 정확히 나누고 있다. 이러한 분량의 분배는 미국 역사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는 결국 전쟁의 발발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제는 교과서들의 내용을 분석해 보겠다. 첫째, 교과서들이 다루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전쟁의 발발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는 이에 관해서는 모든 교과서가 한국전쟁은 국제적인 냉전의 일부였다는 기본적 틀을 받아들이고 있다. 더불어 대부분의 교과서는 남한과 북한과의 경쟁과 충돌이 한국전쟁의 발발 요인 중 하나라는 내전적인 시각 또한 받아들인다. 우선 모든 학자들은 한국전쟁을 냉전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는 북한의 남침이 소련과 중국의 ‘독려(encouragement)’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브린클리와 포너는 유럽에서 시작한 냉전이 아시아로 확대되어 열전(전쟁)으로 발발한 것이 한국전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포너는 한국전쟁을 냉전의 ‘첫 번째 전장(battlefi eld)’이라고 지칭하였다. 더욱이 브린클리, 포너, 시, 그리고 코르베트와 로크의 책에서 한국전쟁을 다루는 장의 제목에는 모두 ‘냉전(Cold War)’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들은 내전론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브린클리는 북한이 한반도의 통일을 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였고 소련과 중국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야 이를 지지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포너 역시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에서 북한이 통일을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고 주장하였다. 시 역시 1945년 이후 남북한의 긴장이 내전으로 발발하였다고 암시하고 있다.
둘째, 그런데 교과서들은 최근 한국의 학자들이 중요시하는 한국전쟁 중에 미군을 포함한 여러 군대가 자행했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주제는 아예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한국전쟁이후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의 변화 같은 새로운 연구 성과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판문점 비무장지대에서 경비 중인 한국군

1950년 8월 25일 한국전쟁 중
한국전쟁과 미국의 대학 교과서와 미국 사회
미국의 대학 교과서에 기술된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사회가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수 있다.
첫째, 미국사회에서 한국전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미국 내에서 한국전쟁은 ‘1812년의 전쟁(War of 1812)’과 더불어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미국 대학교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한국전쟁에 관한 분량이 극히 적은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둘째, 미국의 대학 교과서들은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이외에 다른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미국 내의 전문학자들의 연구는 한국전쟁이 이후 세계 정치에 끼친 영향, 전쟁 포로문제, 한국전쟁 중 민간인들의 생존문제 등 새로운 분야로 옮겨가고 있지만, 아직 대학 교과서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또한 미국과 북한의 근본적인 적대적인 관계 때문에 전쟁기원론에 중점을 준 기술이 압도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미국 대학 교과서의 기술이 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창작한 '미국 대학 교과서의 한국전쟁 서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