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2015년 01월호 뉴스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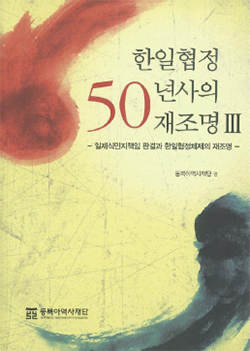
한일협정 체결 49주년이던 지난 6월 22일 재단은 '일제식민지책임 판결과 한일협정체제의 재조명'을 부제로 한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제3권을 발간하였다. 재단은 2010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사에 대한 성공적인 재조명을 통해 《한일강제병합 100년의 역사와 과제》를 발간한 바 있다. 이어 역사적인 후속과제로서 청산되지 못한 일제식민지책임과 관련하여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연구 시리즈를 발간해 오고 있다.
이 책은 앞서 발간된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Ⅰ·Ⅱ권의 주제인 '한일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조명'과 '한일협정체제와 식민지책임에 대한 재조명'의 연속선상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일본은 일제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전제 아래 일본군'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 등 식민지책임 자체를 부인하고 한일협정으로 완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책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비롯하여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식민지책임 판결과 한일협정체제의 재조명"을 주제로 하고 있다.
재단은 동북아역사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한일 간 역사 갈등의 본질인 일제식민지책임 문제를 수년간 규명해 왔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한국 사법부는 '역사적 진실'과 '국제 법적 정의'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첫째, 2011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일본군'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의 헌법소원에서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상의 재교섭과 중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은 정부의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 내린 위헌결정과, 둘째, 2012년 대법원이 일제강제징용피해 배상소송에서 일제강점과 식민지배를 합법으로 보는 일본 판결이 이를 불법으로 보는 우리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상충되므로 그 효력을 승인할 수 없다는 역사적인 판결이다.
이러한 일제식민지책임 판결과 한일협정체제의 재조명을 주제로 한 논의에는 역사학, 국제법, 국제정치학 등 이 분야에서 권위 있는 일본의 전문가 6인을 포함하여 한·일 양국의 학자와 소송을 수행해온 실무전문가 등 총 9인이 집필에 참여하였다. 다음에서 주요 논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은 독선적인 해석
아디치 슈이치(足立修一) 변호사는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의 한계와 문제점의 검토'라는 논문에서 일본에서의 전후보상 재판의 한계로 ① 사실 인정의 벽, ② 국가무답책(國家無答責)의 벽, ③ 시간의 경과의 벽, ④ 정치의 벽 등 4가지 장벽을 제시한다. 일본 정부는 현시점에서 한일청구권협정 청구권 포기 조항에 대한 해석은 "모두 해결 완료"라고 보며 한편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은 일본 국내에서만 타당한 독선적인 해석일 뿐이라고 비판하였으며 그 근거로, 2011년 8월 30일의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2년 5월 24일의 한국 미쓰비시 소송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었다.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국제학술회의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국제학술회의이종원 와세다(早稲田)대학 한국학연구소장은 '일본의 역사인식과 전후보상 정책의 재검토'라는 논문에서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를 둘러싼 공방과,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보수파의 반동과정에 대해 조감하였다. 1990년대 이후 역사인식과 전후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와의 역사화해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 일본의 정치·경제적 위상이 상대적으로 저하됨에 따라, 사회의 내향화(內向化)와 정치의 '우경화'가 심화되어, 현재의 아베 정권의 자세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요시자와 후미토시(吉澤文壽) 교수는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에서의 '식민지책임'론'이라는 논문에서 한일회담의 교섭은 식민지지배의 불법성이나 부당성을 둘러싼 인식이 공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교정상화가 실현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한일협정으로 해결완료'론과 '한국 정부의 부작위'는 식민지지배로 인한 모든 조선인 피해자에게 인종(忍從)을 강요하는 것이다. 한일기본조약 및 제 협정의 극복과, '식민지책임'을 정립할 책무는 오늘의 한·일 양 국민에게 있음을 주장하였다.
아베 코기(阿部浩己) 교수는 '한일청구권협정과 일본군'위안부' 문제'라는 논문에서 식민지주의를 극복하지 않고 21세기는 있을 수 없다는 글로벌한 법규범의 조류를 전제로, 일본정부가 부정의를 바로잡는 협의·중재에 진지하게 응해야함을 촉구하였다. 또한 협의·중재에 따르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한일청구협정을 통해서 스스로 받아들인 국제법상의 의무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 시작된 전후보상 재판처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도 식민지지배가 그 배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적극적 평화 도모해야
한일지식인이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천명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 원천무효' 공동성명은 '식민주의의 역사적 종식'을 담은 2001년 더반선언의 동아시아 버전으로서 올바른 역사의 정립을 통해 역사화해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일제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전제로 하는 국제법상의 기본적인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에서 나아가 오늘날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를 도모함으로써 2015년 한일협정 반세기는 동북아평화공동체를 함께 실현해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