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2020년 04월호 뉴스레터
◆ 비전공자와 일반인도 읽기 쉬운 고조선·부여사
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는 고조선과 부여사 연구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은 ‘사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새로운 문헌 기록을 찾고 번역해왔다. 학계 전공자들과 팀을 조직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번역된 적 없는 사료 번역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 첫 결실로 2019년 12월 『한국 고대사 자료집: 고조선·부여편 I-17세기 이전 사료』라는 자료집을 펴냈다.
이 책은 조선시대 대동야승을 포함한 17세기 이전 사료를 저술과 편찬 순으로 엮었다. 『고조선·단군·부여 자료집(상·중·하)』(2005년, 고구려연구재단)을 참고로 사료 원문을 일일이 찾아 비교하며 오탈자를 교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삭제했다. 권제(1387~1445)의 『역대세년가(歷代世年歌)』, 권문해(1534~1591)의 『대동운부군 옥(大東韻府群玉)』 등 고조선·부여사 연구에서 활용되지 못했던 사료를 번역하여 추가했다. 오래전 개인에 의해 번역되었던 부분은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새롭게 번역했다. 인터넷을 통해 번역문이 제공되고 있는 『삼국유사』 등과 같은 사료는 관련 기관과 개인 및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 편집하여 수록했다. 따라서 자료집 1권은 고조선과 부여 관련 기록 가운데 17세기 이전 사료를 망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존의 번역문까지 전부 모아 한 데 엮는 것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쉽게 하고 부족한 사료 공백을 덜기 위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문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비전공자와 일반인도 보기 쉽게 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사료의 이미지 일부를 부록으로 수록하고, 저술과 편찬 순으로 사료를 배치함으로써 고조선과 부여에 관한 서술과 인식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가 잘 드러나도 록 했다. 모든 사료에 서지학적 해제를 달아 이것이 고조선·부여사 연구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도 간략하게 제시해 놓았다.
◆ 18세기 이후부터 근현대까지 한·중·일 사료를 총망라하기 위해
현대 역사학자들이 고조선, 단군, 부여를 연구하는 것처럼 전통시대 학자들과 문인들도 이를 탐구하고 기록으로 남겼다. 사찬(私撰) 사서류, 문집, 수필, 야사, 만록(漫錄), 기행문 등은 고조선과 부여에 관한 당대 지식인의 인식을 엿보게 해준다. 고종 32년(1895년) 학부 편집국이 국한문 혼용체로 편찬한 소학교용 교과서 『조선역사』 등 근대 교과서에도 고조선과 부여사가 기록됐다.
중국 사료 가운데에도 참고할 만한 기록이 많은데 고조선·부여 관련 사료를 통틀어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것들로 『관자(管子)』, 『산해경(山海經)』·『전국책(戰國策)』 등 선진(先秦)문헌은 고조선이 활동한 시기에 저술되었다. 『사기』·『한서』·『후한서』·『삼국지』·『진서(晉書)』 등 중국 관찬사서 열전에는 독립적인 항목으로 기록되어 있다. 『염철론(鹽鐵論)』, 『방언(方言)』, 『박물지(博物志)』, 『설문해자(說文解字)』 등 개인이 남긴 문헌에도 고조선과 부여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위와 같은 한·중 사료 중 일부는 번역되고 연구가 됐다. 그러나 한 번도 번역된 적 없는 것도 많다. 따라서 재단은 이번 자료집 간행을 시작으로 ‘18세기 사료’, ‘19세기 이후 사료’, ‘조선시대 관찬 사료’, ‘고려·조선시대 문집’, ‘지리지·근대 교과서’, ‘중국·일본 사료’를 순차적으로 번역하여 자료집을 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2년 동안 고대사 전공자와 조선시대 전공자로 구성된 번역팀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매월 번역 회의를 하면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작은 부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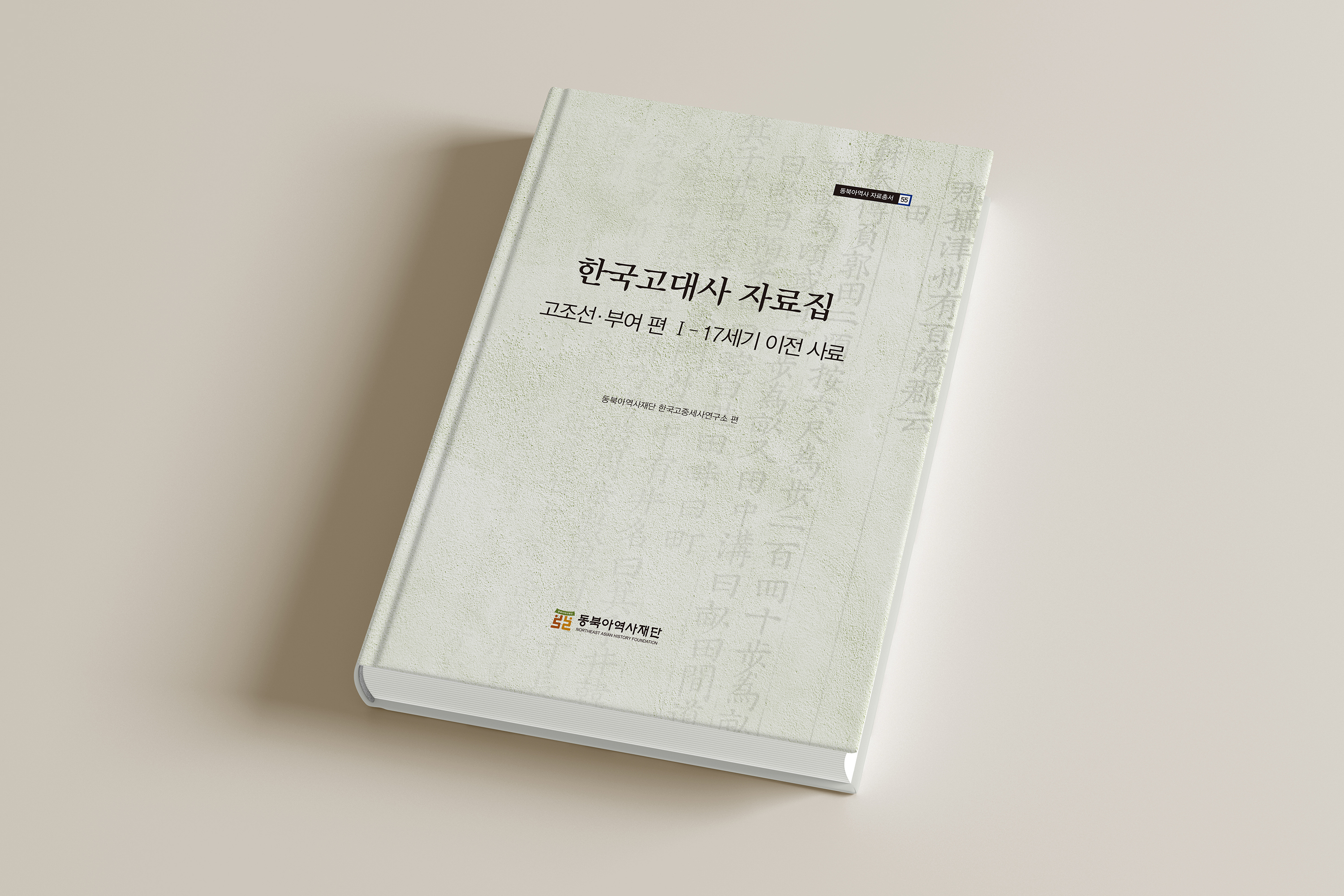
◆ 사료 부족 해소와 새로운 연구 창출의 밑거름이 되기를
한국사 연구에서 고조선과 부여사 분야만큼 사료 부족과 해석에 논란이 많은 경우도 없다. 역사가 오래된 것에 비해 남아 있는 기록이 적고, 자체 제작한 역사서도 없어서 연구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고조선의 경우 가장 이른 시기의 사료가 1145년 고려시대 김부식이 작성한 『삼국사기』인데, 그나마 신라 본기와 지리지에 단편적으로 나온다. 이보다 100여 년 후에 작성된 『삼국유사』 기이편에 왕검조선과 위만조선이 별도의 편목으로 기록됐다. 이마저도 고조선 멸망 후 1천 년이 훨씬 지난 후대의 일이다. 중국 사료로는 『사기』가 처음으로 열전에서 조선을 별도의 편목으로 기술했다. 이는 고조선 말기 중국 한나라 사람인 사마천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고조선 연구의 1차 사료가 된다. 이후 작성된 『한서』, 『후한서』, 『삼국지』 열전 등도 고조선 관련 기사가 비교적 잘 남아 있는 축에 속한다.
부여의 경우 100여 년을 고조선과 동시대에 있었고 고구려 등 후대의 나라들과도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여 관련 기록은 많지 않다. 『삼국사기』 고구려 및 백제 관련 기록에서 산 발적으로 보일 뿐이다. 『삼국유사』 기이 편에 ‘북부여’와 ‘동부여’로 기록되어 있다. 중국 사료에서는 『후한서』와 『삼국지』 열전에 별도의 편목으로 기록됐다. 중국 측 사료에도 부여는 고구려 등 한국 고대 국가 관련 기록에서 부수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위에 언급한 사서를 비롯하여 고조선과 부여사 연구에서 인용되고 있는 주요 사료는 대부분 번역이 됐다. 일부는 인터넷과 출판물을 통해 학계와 사회에 제공되고 있다. 드물게 개인 연구자가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고 번역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같은 사료를 반복적으로 인용하거나 해석을 달리하여 접근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고조선과 부여사를 연구하기 위한 사료 발굴이 시급한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관련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종합한 적이 없었다. 한문으로 된 사료 번역은 기본 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연구자 개인의 몫이었다. 이에 재단은 그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놓친 작은 기록까지도 수집하고 번역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올해는 18세기와 19세기 이후에 작성된 사료를 중점적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 번역이 완료되면 이미 완료된 사료의 번역문을 포괄한 두 권의 자료집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이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고 전권(全卷)이 간행되면 고조선·부여사 관련 국내외 사료의 번역문을 집성한 사실상 최초의 자료집이 될 것이다. 이로써 사료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조선사와 부여사 연구가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고조선과 부여가 고대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보여 주는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학술적으로는 동아시아사 속의 고조선과 부여로 자리매김하는 새로운 연구의 창출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