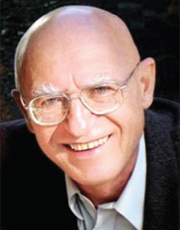
재단 새 책
《쿠릴문제 – 역사, 법, 정책 그리고 경제》 "쿠릴열도는 러시아 땅" 주장을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저술
이 책은 러시아의 보리스 이바노비치 트카첸코(Борис Ивано вич Ткаченко)가 2009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의 네벨스코이(Невельской)해양대학교에서 발간한 책 “Курильская проблема: история, право, политика и экономика” 을 완역하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쿠릴문제 - 역사, 법, 정책 그리고 경제》로 출판한 것이다.▲ 보리스 이바노비치 트카첸코현재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동방민족 역사, 고고학, 민속학연구소에 재직 중인 트카첸코는 러·중, 러·일 국경문제에 관한 많은 연구 업적을 남겼다. 이 책 역시 국경문제와 관련하여 그가 저술한 연구 업적 중 하나다. 독도 문제로 일본의 도전을 받고 있는 한국인들이 반드시 한 번은 읽어봐야 할 가치가 있는 책이다.트카첸코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의 쿠릴열도 점령이 전적으로 합법이며, 현 시점에서 쿠릴열도가 지닌 전략적 가치, 막대한 지하자원과 수자원 등을 고려할 때 쿠릴열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토 주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기본 관점에서 이 책을 서술하고 있다. 이런 관점은 객관적 서술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 책 전반에 걸쳐 진지하고 흥미로우면서도 대부분 객관적인 논리 전개로 러·일의 영토문제에 관한 저자의 견해를 밝히고 있고, 실제 그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독자를 설득하는 꼼꼼한 자료 수집과 치밀한 분석제1부의 내용에 따르면, 일본은 크게 두 가지 논거에서 그들 스스로 북방영토라고 부르는 쿠나시르(Кунашир), 이투루프(Итуруп), 시코탄(Шикотан), 하보마이(Хабомай) 등 4개 섬에 영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역사적으로 이 북방영토를 최초로 발견하고 그 지역을 먼저 실효지배한 국가가 일본이다. 이런 일본의 권리는 1855년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체결한 시모다(下田) 조약에 따라 국제법상으로도 확인되었으며,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으로 러·일 양국 국경문제가 확정되
글 김종헌 (고려대 역사연구소 교수)